공유하기
[광화문에서/한기흥]한일 관계의 열정과 냉정
-
입력 2006년 4월 24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한국이 일본의 수로 측량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방침을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용한 외교’의 수정을 천명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이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막겠다”는 비장한 발언까지 한 것은 피 끓는 국민 정서와 맥을 같이한다. 정치권에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 일본의 야심을 좌절시켜야 한다”(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이 단합해서 일본에 대항할 것”(한화갑 민주당 대표)이라는 민족공조론이 나온 것도 매한가지다.
이런 열정적 대응은 결국 일본의 수로 측량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독도 문제를 포함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준 일본과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선 냉정한 상황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작년 3월 독도 문제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관련해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앞으로 일본과의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례적으로 초강수를 둔 것이지만 일본은 이를 노 대통령의 ‘국내용 발언’으로 일축했고,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노 대통령을 같잖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이 만만하게 보는 건 노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자체가 아닐까.
일본이 틈만 나면 침략 근성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국력의 우위에 있다는 오만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중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본과의 국력 격차를 조금 좁혔을 뿐 모든 면에서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일본이 국력에서 한국을 앞선 것은 임진왜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1816년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백제에서 책을 얻어다 보았는데 처음에는 매우 몽매했다. 그 후 중국의 절강 지방과 직접 교역을 트면서 좋은 책을 모조리 구입해 갔다…지금 와서는 그 학문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고 탄식했다. 다산의 비통한 고민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선 일본이 우리 EEZ를 침범하면 해경이 아닌 해군이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일 간 군사력의 차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한일 관계다.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국의 민족적 자긍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지만 객관적인 일본의 힘을 한국만 ‘주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족 감정에 따른 착시(錯視)에서 벗어나 한일 간 국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워야 한다. 선조들의 한 맺힌 극일(克日) 염원이 뜨거운 열정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한기흥 논설위원 eligius@donga.com
광화문에서 >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글로벌 이슈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2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8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9
오세훈, 국힘 공천 받으려면 ‘1대1 결선’ 거쳐야 할듯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0
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 美해군이 호위”…유가 급등에 대응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2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8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9
오세훈, 국힘 공천 받으려면 ‘1대1 결선’ 거쳐야 할듯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0
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 美해군이 호위”…유가 급등에 대응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조종엽]문화 관광 상품 싸게 하려다 미래 먹거리 비지떡 될수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3/04/13346627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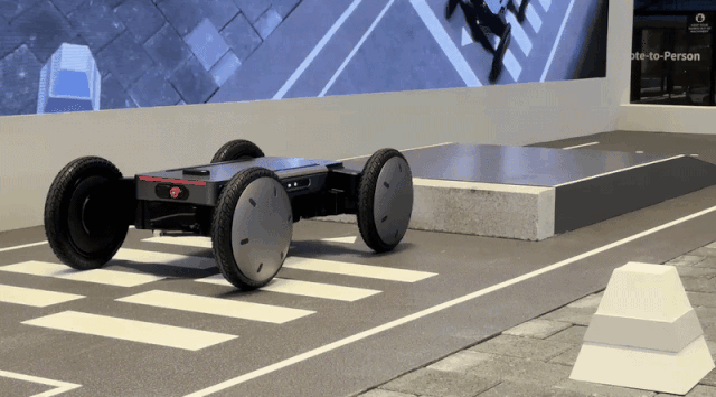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