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홍찬식/초심
-
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35분
글자크기 설정

▷1970년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은 나라 전체가 잘살아 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결과였다. 외환위기 직후의 금 모으기 운동은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음의 결집에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강렬한 눈빛을 잃지 않으면서 4강 진출의 꿈을 이뤄냈다. 어디 이뿐일까. 직장을 잃은 뒤 재기를 노리는 평범한 중년 가장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결심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대통령이 바뀔 때나 새해 벽두에 흔히 초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초심 유지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초심대로만 잘 밀고 나간다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 탓일까.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면서 전교조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마도 윤 교육부총리는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풀려면 일차적으로 전교조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여긴 듯하다.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민주화 과정에서 스스로를 희생해 가며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는 바다. 반면에 99년 합법화 이후 나타난 지나친 투쟁성은 학부모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법화 당시 전교조는 ‘비합법시대의 어려웠던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표출되었던 상대적 과격성 급진성을 말끔히 걷어내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윤 부총리가 바라는 변화가 이것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초심은 언제나 순수하고 신선하다. 새잎으로 가득한 신록의 계절은 초심을 생각하기에 더욱 적당한 때가 아닌가.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횡설수설 >
-

사설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주성하의 ‘北토크’
구독
트렌드뉴스
-
1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2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3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4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5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6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9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10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
9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10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트렌드뉴스
-
1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2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3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4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5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6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9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10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
9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10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우경임]루이비통 꺾은 48년 명품 수선 공방](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7/13343993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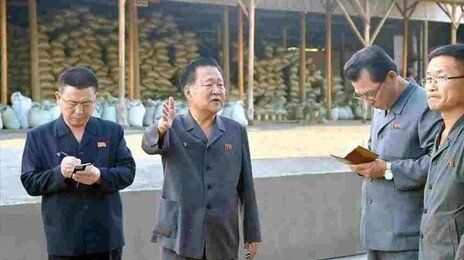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