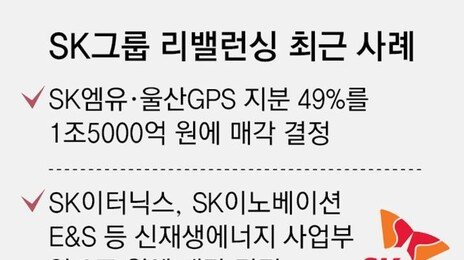공유하기
[헌법의 눈]김상겸/'파크뷰'에 비친 권력의 오만
-
입력 2002년 5월 19일 18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그렇지만 무뎌지는 감각 속에서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사건, 그것이 분당의 파크뷰사건이다. 이 사건은 파고들수록 의혹이 커지고 꼬리를 감춘 사실들이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 어떻게 한 정권의 끝자락에 들어오면 한결같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신기하기도 하다.
진정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과거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무용지물인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난히 부동산에 집착하는 한국인의 속성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런 부류의 사건이 파크뷰사건이라는 생각도 든다.
▼공정경쟁 질서의 가치 상실▼
이렇게 파크뷰사건은 우리의 주거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에 우리의 시야를 떠날 수가 없다. 파크뷰 문제의 표면에는 특혜분양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토지용도변경이라는 의혹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다양하게 집결된 곳이 파크뷰사건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분양 등 각종의 특혜분양 의혹은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정한 경쟁이 그 얼마나 허울에 찬 위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여기서 신뢰라는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 국민은 가진 자의 힘 앞에서 농락당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법질서의 어두움을 보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은 무용지물이고 국가는 결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물론 시공회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가는 부정이나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사법처리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회사와 개인간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문제인가.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동산투기사건에 휘말렸던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에는 항상 공공성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국가에 주택정책 개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에 무조건 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헌법의 규정은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는 규정된 그 자체만으로도 보장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상들은 헌법의 권리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파크뷰사건의 또 다른 모습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의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국가 권력의 오만함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편법을 일삼는 곳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국가가 추구하는 바는 정의이고, 정의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법 당국의 손길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은 진실을 파헤치고 엄정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헌법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일그러진 법치의 자화상▼
특히 행정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가능하게 할 부동산 관련 법규의 불투명한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 역시 명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요청이다.
그리 길지 않은 50여년의 헌정사에서 법치국가의 정립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결국 파크뷰사건은 우리 법치국가의 자화상이다.
이제 국민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그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과 부정에 헌법은 장식물로 변하고 법치국가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문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이다. 더 이상 국가의 최고 법질서에 오욕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말자.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구하는 법치국가로의 길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키노 >
-

K-TECH 글로벌 리더스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2
‘李 정책멘토’ 이한주 재산 76억…55억이 부동산, 주식은 없어
-
3
85세 강부자, 건강한 근황 “술 안 끊었다”
-
4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30대女 “약물 투약후 운전”
-
5
알파고 쇼크 10년…GPU 채워진 기원서 ‘AI 기보’ 공부한다
-
6
[오늘의 운세/2월 27일]
-
7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8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9
“강아지 뒤 배경 지워줘” 하자… 5초만에 깔끔한 사진 변신
-
10
스모킹건 된 챗GPT… 약물 살인-기밀유출 ‘질문’에 꼬리 밟혔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6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7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8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9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트렌드뉴스
-
1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2
‘李 정책멘토’ 이한주 재산 76억…55억이 부동산, 주식은 없어
-
3
85세 강부자, 건강한 근황 “술 안 끊었다”
-
4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30대女 “약물 투약후 운전”
-
5
알파고 쇼크 10년…GPU 채워진 기원서 ‘AI 기보’ 공부한다
-
6
[오늘의 운세/2월 27일]
-
7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8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9
“강아지 뒤 배경 지워줘” 하자… 5초만에 깔끔한 사진 변신
-
10
스모킹건 된 챗GPT… 약물 살인-기밀유출 ‘질문’에 꼬리 밟혔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6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7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8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9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키노 코너]누드모델 이승희 「물위의 하룻밤」 캐스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