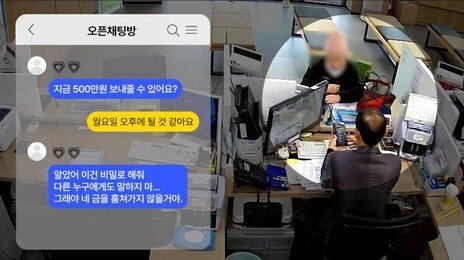공유하기
[소설]오래된 정원(274)
-
입력 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글자크기 설정
마파 두부라꼬요. 돼지고기하구 두부는 보이는데 이건 뭔교?
응 어묵 사온 걸 어따 넣을까 하다가 다 섞어 버렸지.
미경이는 그들에게 눈을 흘기고는 부엌으로 나갔고 나는 이 작은 소란을 오랫만에 즐기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마당 쪽으로는 작은 창이 뚫려 있었지만 반대편에도 큼직한 창이 나있어서 맞바람으로 방안은 제법 시원한 편이었다. 나는 빨래가 걷힌 큰 창가에 섰다. 높은 지대라 아래쪽에 다닥다닥 붙은 집의 지붕들이 보이고 그 넘어로는 불빛이 휘황한 도심지가 내려다 보였다.
저 불빛 넘어에 줄지어 있는 불이 보이지? 거기가 바다야. 낮에는 잘보인다구. 뒷전에서 송영태가 말했다.
생각보단 괜찮은데.
그러게 말야. 미경이가 명당을 차지했지 뭐야. 그래서 가끔 구박을 감수하면서 피서하러 오는 신세지.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얌전히 앉아있는 미경이의 남자 친구를 돌아보고나서 송에게 물었다.
이젠 괜찮은 거야?
알게 뭐야. 난 지금 완전히 행불일 텐데. 이름도 직업도 다 바뀌었는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였다. 나는 현우씨에게서 그의 도피 행각을 자세히 들은 적이 있었고 이런 동네와 분위기가 낯선 느낌이 들질 않았다.
지금 뭘하구 있어?
어, 공장 기능공이지. 나 선반 기능자격 땄어.
또 일판 벌이겠구나.
아니 아니, 이건 그렇지 않아. 주객이 바뀌면 안되거든. 나는 노동자의 친구로서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야. 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 서길 바래. 송이 앉아 있던 청년을 나에게 소개했다.
여긴 기헌이, 미경이하구 같은 공장에 다녀. 나이두 동갑이구 둘이 친구래. 여긴 한윤희라구 내 친구야.
청년은 수줍은 웃음으로 내게 인사했다. 나는 송에게 물었다.
그럼 지난 일년간 줄곧 여기 있었어?
아니, 안양 가서 친구들 도움으루 선반 배우러 다녔지.
집엔 아무 연락두 없이?
동생들 통해서 가끔 연락하다가 요샌 안해. 무소식이 희소식인줄 알거야.
정말 몸은 괜찮은 거야?
나는 정말 볼이 홀쭉해지고 피부도 꺼칠해 보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송이 팔을 들어 알통을 만들어 보이며 말했다.
밥 잘먹겠다, 맘 편하겠다,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담 다행이다. 당분간 여기서 살겠네.
송영태가 쾌활하게 말했다.
당분간이라니… 여기서 평생을 보내야지.
나는 어쩐지 그의 낙천적인 분위기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 뒤, 겨울이 올 때까지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헤어질 때 미경이를 통해서 연락을 하겠다고는 말했지만 미경이는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 뭔가 저희들끼리 분주했을 것이다. 나중에야 그들이 여러 개의 학습조와 동아리를 꾸리고 있던 중이라는 걸 들었다. 그들은 구로동과 영등포에서 당시에 노학연대 투쟁이라 부르던 시위를 해내기도 했다.
〈글:황석영〉
화제의 당선자 >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2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6
10㎏ 뺀 빠니보틀 “위고비 끊자 다시 살찌는 중”…과학적 근거는? [건강팩트체크]
-
7
[단독]차 범퍼에 낀 강아지, 학대? 사고?…사건의 진실은
-
8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9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10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곳서 거부…구급차서 출산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6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7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8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트렌드뉴스
-
1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2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6
10㎏ 뺀 빠니보틀 “위고비 끊자 다시 살찌는 중”…과학적 근거는? [건강팩트체크]
-
7
[단독]차 범퍼에 낀 강아지, 학대? 사고?…사건의 진실은
-
8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9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10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곳서 거부…구급차서 출산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6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7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8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4·15총선]공장-논밭-실험실서도 입성…이색경력 당선자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