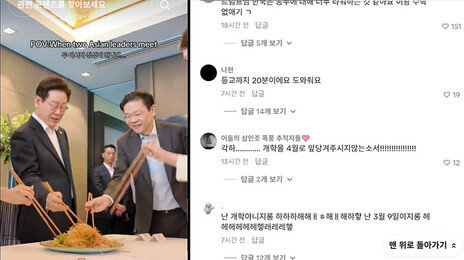공유하기
[소설]봉순이 언니(54)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글자크기 설정
나는 봉순이 언니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집요한 저항의 몸짓을 뒤통수로 느끼면서 까만 씨를 받아내 원피스의 앞주머니에 넣었다. 통통하던 나팔꽃 이파리와 꽃잎들은 이제 말라버렸다. 하지만 이 눈동자처럼 검은 씨앗이 내년 봄에는 다시 담장따라 피어나리라. 아침마다 이슬을 머금은 그 황홀한 보라빛. 열세개, 열네개, 열 다섯개…. 봉순이 언니의 울부짖는 소리, 내 눈에서도 자꾸 눈물이 솟고 있었다. 나는 흰 블록담을 따라 내 몸을 더 작게 붙였다.
―안가요! 안간다니까!
―글쎄 갑자기 또 웬 고집이니? 아침까지는 그러겠다고 하더니, 이것아, 동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웬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르길!
나는 꽃밭에 서서 계속 울었다. 언니가 하지 않으려하고 어머니가 하게 하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어렴풋한 느낌은 있었고, 설사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게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승강이를 들으며 아마 산다는 게, 아마도 힘겹고 슬프고, 등불 하나 없이, 먼 먼 들판을 걸어가는 일 같다는 걸, 누구나 헨젤과 그레텔보다 험하고 처량하게 숲속을 헤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것을 나는 봉순이 언니의 울음소리를 통해 미리, 내 인생의 낮은 배경음을 듣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은 뭐하러 집으로 돌아왔을까, 마녀를 죽이고 빼앗은 보물을 가지고 숲속에서 그냥 오순도순 살지. 뭐하러 그 악독한 새어미와 줏대없는 아비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을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도, 어머니보다 더 살이 찌고 힘이 센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문가에 당도했다. 어머니가 대문가에 봉순이 언니를 세워 놓았고 이어서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너 여기까지는 끌고 왔다만, 나도 더는 못하겠다. 어떻게 할래? 갈래 말래? 간다면 모든 걸 책임져주겠지만 가지 않겠다면 좋다! 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나와는 이제 끝이고, 그리고 당장 우리집에서 나가거라. 자 어서 말해라. 가겠니? 말겠니?
어머니는 단호했다. 이제 대문을 밀고 골목으로 나가면 마주치게 될 동네사람들의 이목도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싫다고 몸부림치며 어머니에게 거의 끌려나가던 봉순이 언니의 고개가 푹 수그려졌다.
―어서 말을 하라니까!
순간 봉순이 언니의 얼굴이 실룩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글:공지영>
총선 : 여론조사 >
-

알파고 쇼크 10년, AI와 인간 공존 실험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동아광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여론조사/내년총선 지지정당]40代이상-한나라 30代-신당](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