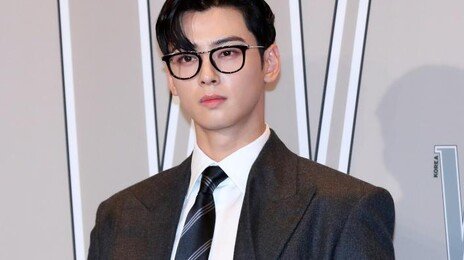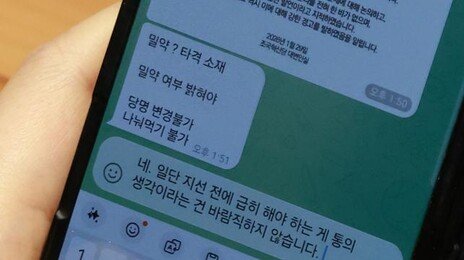공유하기
복잡한 세상…쌓이는 스트레스… 심리상담소 성황
-
입력 2002년 3월 6일 18시 34분
글자크기 설정
‘발표 장애’라는 증상이 주는 스트레스로 잠까지 설칠 정도였지만 정신질환자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정신과 의사를 찾을 엄두를 못 내다 최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심리상담소를 찾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 외에도 이 곳을 찾은 사람이 의외로 많았고 예약 손님이 수십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 심리상담사를 찾아 상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9년째 심리상담소를 운영 중인 민병배(閔丙培)씨는 “일주일에 20여명이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사교육 열풍, 주식투자 실패,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재테크 경쟁 등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
성신여대 심리학과 김정규(金正圭) 교수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심리적 고민도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친밀감과 유대감 등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하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 것도 심리상담소를 찾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심리상담소와 심리상담사도 크게 늘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따르면 전국에 개업 중인 심리상담소는 80년대 3곳, 90년대 초 6곳에서 96년 이후 41곳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가진 한국임상심리학회 소속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전문가, 그리고 97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자들이다.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급과 2급을 합쳐 57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정신과 의사와 달리 한 번에 6만∼7만원을 받고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심리상담만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의료 행위’가 아닌 ‘서비스 행위’로 간주된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진영(崔辰玲)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 전문가의 활동 비중이 비슷하다”며 “한국 사회가 삶의 질을 고려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것도 심리상담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8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9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8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9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