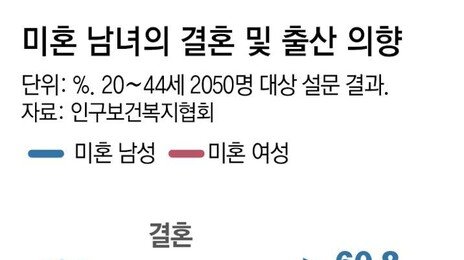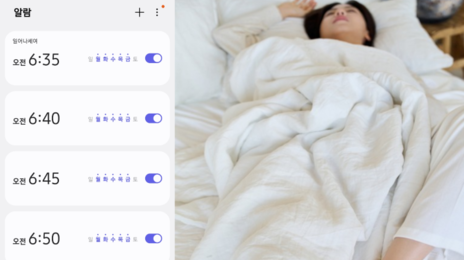공유하기
[선진국의 의약분업]가벼운 질병 1·2차기관 진료 제도화
-
입력 2000년 4월 4일 20시 24분
글자크기 설정
바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라는 장치 때문이다. 가벼운 질병을 가진 환자는 3차병원에 절대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환자를 위한 조제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퇴원하는 환자나 외래 환자들에게도 처방전만 손에 들려 보낸다. 이는 중환자나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심지어 중증의 정신질환자도 예외가 없다.
캐나다 토론토시 마운트 시나이 종합병원 약국장 빌 윌슨은 “환자가 1,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진료기관으로 곧바로 올 수는 없다”며 “혹시 응급환자가 3차 병원으로 오더라도 도착 순서대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심각도에 따라 진료를 하기 때문에 증세가 가벼운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유명 의사에게 1분 진료를 받기 위해 종합병원 진료실 밖에서 1∼2시간씩 장사진을 치고 대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종합병원에는 아예 외래 환자를 위한 구내 약국이 없느냐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는 “1개는 있다”며 약국으로 안내했다. 이 약국은 5평 남짓한 일종의 구내 매점으로 아스피린 등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의약품과 함께 칫솔과 잡지 등 자잘한 생활용품을 팔고 있었다. 이 1개의 구내 약국도 외래 환자용이 아니라 병원 직원을 위한 편의점이라는 설명이었다.
미국 워싱턴DC 어빙가에 위치한 워싱턴호스피털. 700병상 규모의 이 병원에서도 외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조제실은 없다. 이 병원 외래약국 담당 리처드 브로더는 “환자들도 처방전을 받아 동네의 단골약국을 이용하는 것에 습관이 들어 있는데다 종합병원에서는 외래 환자가 많지 않고 설령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내 약국을 경영해서는 인건비도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 국민 건강의 1차 파수꾼은 ‘홈닥터’로 불리는 가정의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요즘 집단휴진을 벌이고 있는 동네병원이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환자들은 우선 가정의에게 연락해 진찰 시간을 예약한 뒤 정해진 시간에 병원을 방문한다. 우리처럼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 대기하는 경우란 없다.
야간이나 다급한 질병이 생기면 가정의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다. 가정의들은 모두 비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급히 약이 필요할 경우 환자가 다니는 동네약국의 약사에게 연락해 약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의사들의 조제권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의사들이 굳이 약을 넘보지 않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진료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는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다.
토론토시 블러에서 개업하고 있는 교포의사 김진영박사는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간단한 검사의 경우 캐나다달러로 16달러40센트, 뇌검사 혈압 등 복잡한 검사의 경우 26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캐나다에서는 의약분업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도 약을 조제할 수 있으나 약을 조제하게 되면 진료시간을 빼앗기는데다 조제료도 1달러로 너무 싸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약을 조제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의사 수입에 대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놓아 일정 한도의 수입을 넘길 경우 정부가 보험급여를 삭감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를 쓰고 환자를 여러 명 진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제도는 의사들간 과당경쟁을 막고 환자들에 대해 충실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벼운 질환자들이 동네병원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아예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론토·워싱턴〓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