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이세형]현지 제도 꿰뚫어야 해외 수주 뚫릴텐데…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대우자동차는 1996년 러시아와 합작해 로스토프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3년도 되기 전에 투자금만 날린 적이 있다. 당시 러시아 법제도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뛰어든 탓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슷한 낭패를 겪은 사례는 훨씬 많다.
외교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재외공관장과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잠잠해진 것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로 붐볐다. 하지만 참가 기업인들이 제품 판매나 시장 진출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현지 법제도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재외공관장들에게 제품 판매와 수주 전략을 설명해줄 것을 주로 요청했다. 하지만 공관장들은 상담을 마친 뒤 전혀 다른 얘기를 꺼냈다. 이제는 현지의 제도와 정책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로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올해부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거대시장 인도에서도 기업들이 현지 정부와 제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백영선 주인도 대사는 “각종 제도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인도는 한국 기업들에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승자효과’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만큼 제도와 정치에 대한 이해,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통로를 갖추는 작업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도 현지 사회의 틀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글로벌 무대로 나가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한다.
이세형 경제부 turtle@donga.com
기자의 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더뎁스
구독
-

대덕연구개발특구 10년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 동맥 야금야금 망가뜨린다[노화설계]
-
4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女, 사이코패스 판명”
-
5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댔다”…트럼프 ‘무력화’ 주장 반박
-
6
UAE 배치 ‘천궁-2’, 실전 첫 투입… 이란 미사일 요격
-
7
“하메네이의 문지기”…차남 모즈타바,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
-
8
[속보]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9
‘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 “재판, 선거기간과 일치…의도 짐작”
-
10
10억 투자하면 영주권… 2027년까지 연장
-
1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2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3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4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9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10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트렌드뉴스
-
1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 동맥 야금야금 망가뜨린다[노화설계]
-
4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女, 사이코패스 판명”
-
5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댔다”…트럼프 ‘무력화’ 주장 반박
-
6
UAE 배치 ‘천궁-2’, 실전 첫 투입… 이란 미사일 요격
-
7
“하메네이의 문지기”…차남 모즈타바,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
-
8
[속보]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9
‘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 “재판, 선거기간과 일치…의도 짐작”
-
10
10억 투자하면 영주권… 2027년까지 연장
-
1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2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3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4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9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10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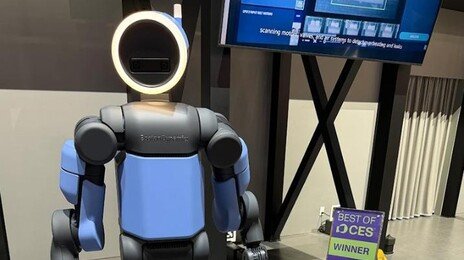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