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호 칼럼]北, 南의 새 정권과 살아가려면
-
입력 2007년 12월 10일 19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북은 이보다 더한 좌절을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추세라면 남쪽엔 보수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달라는 대로 주고, 받으면서도 큰소리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은 잊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빈자리는 상호주의가 메우게 될 것이다.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남북 합의사업들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과거의 대결적 대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괜한 트집이다. 정권의 성격이 바뀐다면 무슨 정책인들 왜 따져보지 않겠는가. 결국 북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남한의 새 정권과 잘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남쪽 사회가 보수화됐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간단한 징후 하나를 보자. 10월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 신문사가 대학생 2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1%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중도적’은 23.2%, ‘진보적’은 33.5%였다. 보수와 중도를 합하면 58.3%에 이른다. 서울대만 떼어서 보면 보수의 비율은 40.5%로 2000년의 13.2%, 2002년 17.2%, 2005년 27.6%보다 훨씬 높아졌다. 북이 ‘혁명의 전위’로 치켜세웠던 대학생들마저 이렇게 변했으니 다른 세대야 오죽할까.
햇볕 10년의 추억, 이젠 버릴 때
이런 변화에 북은 적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호주의에 익숙해져야 한다.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엄격한 대칭적 상호주의를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의 원칙은 지켜 나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 정권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시혜(施惠)가 아닌 거래(去來)로 보고 점차 일정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전쟁 난다고? 천만에.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禮義)에서 출발한다. 이쪽이 호의를 베풀면 저쪽도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 흔히 “가난한 북이 뭘 주겠느냐”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웃집에서 떡 접시를 받으면 마당의 감나무에서 감이라도 몇 개 따서 보냈다. 이것이 상호주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줄 게 없으면 국군포로나 납북피해자 몇 사람 만이라도 돌려보내야 한다.
예를 더 들어 보자. 북은 지난주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합의해 줬다. 촬영·편집장비와 차량 2대 지원 외에 영상편지 한 통에 1000달러씩 받는 조건이라고 한다. 장비 대 주고 금강산에 번듯한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지어 줬는데 또 돈을 내라니, 지나치지 않은가. 입만 열면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이산 동포의 한(恨)까지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정부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햇볕주의자들은 북을 끌어안으려고 애를 썼지만 북은 이처럼 다루기가 더 힘든 상대가 되고 말았다. 햇볕정책을 역이용해 핵을 갖게 된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런데도 계속 햇볕만을 쪼여야 하나. 새 정권에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북이 남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 지난 10년간 열심히 북의 코드에 맞춘 결과가 이 모양이라면 바꿀 때도 됐다.
진정성 보여야 참된 화해 가능
돌아보면 참 희한한 일이다. 정통성으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비위를 맞춰야 할 쪽은 북인데도 우리가 전전긍긍했다. 행여 북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달라는 것은 제대로 줬는지 늘 조마조마했다. 10년째 그러다 보니 햇볕이 무슨 신성한 이념이라도 되는 양 오인(誤認)돼 반대하는 사람은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세력으로 몰렸다.
새 정권은 이런 미망과 주술(呪術)에서 벗어날 것이고, 또 벗어나야 한다. 북 또한 더는 남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한다. 앞에서는 챙기고, 뒤돌아서서는 좌파를 부추겨 남한 사회를 흔드는 이중적인 행동으로는 참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없다. 매사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앞으로 5년,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이재호 논설실장 leejaeho@donga.com
스타캘린더 >
-

이주의 PICK
구독
-

동아경제 人터뷰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캘린더]율 브린너, 조안 쿠삭 그리고 브라이언 드팔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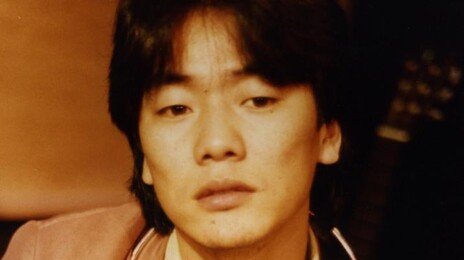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