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南北경제공동체 구상, 韓美 엇박자 부를 과속 경계해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진전과 비핵화, 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특히 강조했다.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운전자’ 역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이라고 스스로 밝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비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경협을 강조하다 보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내에 갖는 게 목표”라는 등 북한이 제재의 틈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는 발언들도 했다. 그보다는 철도 연결 등 대북제재와 직결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렸음을 지적했어야 했다.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갈 경우 북한을 견인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미국과의 엇박자도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막연하고 이상론적인 선순환 논리가 아니라 지난(至難)할 수밖에 없는 비핵화 여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해는 군사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공동번영 바다로 나아가고 있으며…”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화해 논의는 비핵화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알쓸톡
구독
-

컬처연구소
구독
트렌드뉴스
-
1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2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3
“美 파운드리-패키징 공장 짓고 있는데 메모리까지” 삼성-SK 난감
-
4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5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6
‘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40세에 세상 떠나…동료·팬 추모
-
7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8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9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10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1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2
한동훈 ‘당게’ 논란에 “송구하다”면서도 “조작이자 정치 보복”
-
3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4
IMF의 경고…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 규모의 25배
-
5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6
이란 마지막 왕세자 “이란, 중동의 한국 돼야했지만 북한이 됐다”
-
7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8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9
‘이혜훈 청문회’ 하루 앞…野 “보이콧” vs 與 “국힘 설득”
-
10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부과”…유럽 반발
트렌드뉴스
-
1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2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3
“美 파운드리-패키징 공장 짓고 있는데 메모리까지” 삼성-SK 난감
-
4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5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6
‘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40세에 세상 떠나…동료·팬 추모
-
7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8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9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10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1
‘단식’ 장동혁 “자유 법치 지키겠다”…“소금 섭취 어려운 상태”
-
2
한동훈 ‘당게’ 논란에 “송구하다”면서도 “조작이자 정치 보복”
-
3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4
IMF의 경고…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 규모의 25배
-
5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6
이란 마지막 왕세자 “이란, 중동의 한국 돼야했지만 북한이 됐다”
-
7
김경 “강선우 측 ‘한장’ 언급…1000만원 짐작하자 1억 요구”
-
8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9
‘이혜훈 청문회’ 하루 앞…野 “보이콧” vs 與 “국힘 설득”
-
10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부과”…유럽 반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20대 취업자도 고용률도 마이너스… 늘어나는 ‘장백청’](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8/133181404.1.png)

![[횡설수설/이진영]템플스테이 지난해 35만 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181334.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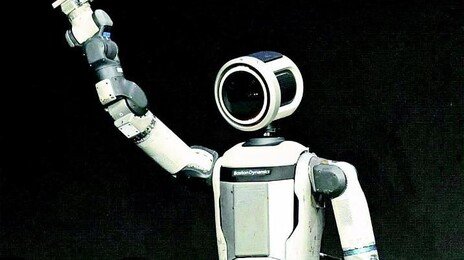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