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8월의저편 456…잃어버린 계절(12)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15분
글자크기 설정

눈을 뜨자 누군가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있었다. 이마에 돋은 흰머리를 모나게 손질하고, 거뭇거뭇 빛나는 누비 조끼에 바지를 입은 늙은 여자였다.
“요치얼마카이스 쿼런바(살아 있느냐)?”
“…훠런(살아 있어요).”
“르번런(일본 사람인가)?”
“자오셴런(조선사람입니다).”
“전쟁은 벌써 끝났어. 일본 사람들은 당신네 나라를 떠났으니 안심하고 돌아가.”
늙은 여자는 숯 검댕과 때로 새까만 나미코의 볼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창백한 주름투성이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띠고는, 두 팔을 살짝 벌리고 허리를 타조처럼 실룩거리면서 어정어정 어디론가 걸어갔다.
나미코는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누웠다. 잠시 후 누군가가 보자기를 걷어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호리병을 건넸다.
“라이, 워라이까이(이리 줘 봐, 내가 열게).” 늙은 여자는 호리병의 뚜껑을 열어 다시 나미코의 손에 쥐어주었다.
“허바(어서 마셔).”
나미코는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마시고, 만두를 우적우적 삼키며 울음을 터뜨렸다.
글 유미리
8월의 저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컬처연구소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8월의저편 457…잃어버린 계절(13)](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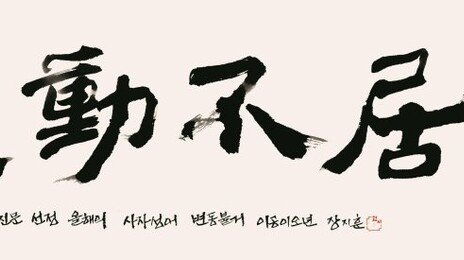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