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파킨슨’으로 묶여 버린 희귀병, 치료 늦어지는 환자들 [홍은심 기자와 읽는 메디컬 그라운드]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다계통 위축증’을 앓고 있는 김 모 씨(남·67)는 이제 말을 잇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의식은 또렷하다. 상황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몸에 갇힌 채 병의 속도를 지켜보는 시간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공포에 가깝다.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병을 진단받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상 기능을 잃어간다. 김 씨의 아내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지켜보는 게 가장 괴롭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다. 현재 다계통 위축증은 행정적으로 ‘비전형 파킨슨’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환자는 파킨슨병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분류는 치료제 개발과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희귀질환 제도는 유병 인구가 적고 근본 치료제가 없으며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신약은 임상 2상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적용된다. 다계통 위축증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희귀질환 분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파킨슨병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굳이 희귀질환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의학적 현실과 행정 논리가 어긋난 지점이다. 이종식 분당차병원 신경과 교수는 “파킨슨병과 다계통 위축증은 병리와 예후가 서로 다른 질환”이라며 “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분류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다계통 위축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다계통 위축증 환자는 지금도 행정상 ‘파킨슨병 환자’로 분류돼 있다. 그 결과 의료비 지원은 받지만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도적 보호에서는 제외된다. 제도가 환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치료 기회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
희귀질환 정책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환자의 시간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서 시간은 곧 생존의 문제다. 다계통 위축증을 파킨슨병이라는 틀에 묶어두는 현재의 분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與서 김어준 저격 “정치의도 담긴 여론조사는 위험”
-
3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4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5
이해찬 前 총리 시신 운구 절차 완료…27일 오전 한국 도착
-
6
용산-강서-송파 등 수도권 50여곳 5만채 주택공급 추진
-
7
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
8
“이렇게 걸면 더 더럽다”…두루마리 휴지 방향의 비밀
-
9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10
[단독]통일교측 “행사에 尹 와주면 최소 10만달러”…실제로 갔다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李대통령, 직접 훈장 들고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
6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7
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
8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9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기다리는 듯”…29일 결론 가능성
-
10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與서 김어준 저격 “정치의도 담긴 여론조사는 위험”
-
3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4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5
이해찬 前 총리 시신 운구 절차 완료…27일 오전 한국 도착
-
6
용산-강서-송파 등 수도권 50여곳 5만채 주택공급 추진
-
7
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
8
“이렇게 걸면 더 더럽다”…두루마리 휴지 방향의 비밀
-
9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10
[단독]통일교측 “행사에 尹 와주면 최소 10만달러”…실제로 갔다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李대통령, 직접 훈장 들고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
6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7
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
8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9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기다리는 듯”…29일 결론 가능성
-
10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파킨슨’으로 묶여 버린 희귀병, 치료 늦어지는 환자들 [홍은심 기자와 읽는 메디컬 그라운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7/13323909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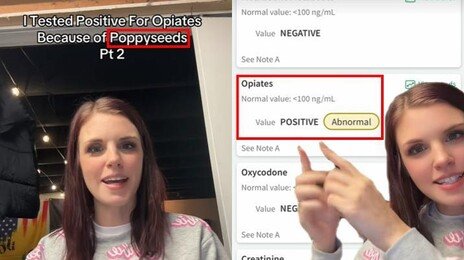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