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330 캠페인]<1>동호인 클럽의 힘
-
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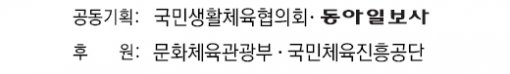
《동아일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7330’ 캠페인을 벌입니다. ‘7330’이란 7일(1주일)간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2006년 12월 기준·2년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8944명 중 44.1%가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운동에 참여하는 듯 보이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24시간 중 스포츠 활동에는 평균 26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TV 시청을 포함한 미디어 활동은 2시간 22분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빈번한 음주 자리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상당수가 비만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7회에 걸쳐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강호의 고수’들이 초보 때부터 지도
철저한 실력사회… 매일 승부욕 자극
서울에 사는 9년차 직장인 김모(37) 씨는 자칭 ‘운동권’이다. ‘운동은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통 직장인에게 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다.
김 씨의 직장 생활사는 ‘운동 시간을 내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헬스클럽 회원 가입도 해 봤고 ‘자출(자전거 출근)’과 도보 귀가도 시도해 봤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일상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못 잡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문제가 뭘까. 아무리 바빠도 하루 1시간, 아니 30분 시간 내기가 그렇게 힘들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재미를 위한 운동’으로.
김 씨가 집 근처 배드민턴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다. ‘이용대 신드롬’을 낳았던 베이징 올림픽도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막상 배드민턴 경기 장면을 보니 ‘이것 봐라. 꽤 박진감이 넘치는 스포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그가 다니는 체육관은 운동의 열기로 후끈했다.
배드민턴을 택한 데는 자신감도 작용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 금을 그어 놓고 친구들과 곧잘 했던 운동인 데다 대학 때는 교양 체육으로 수업을 듣기도 했기 때문. 하지만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두 개에 3만 원짜리 라켓을 들고 체육관을 찾은 김 씨가 왕초보 판정을 받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초보 시절은 열심히 했을 때를 기준으로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간다는 게 베테랑들의 얘기다. 인고의 시간이다. 남들이 게임에 몰두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벽에 붙은 거울을 보며 허공에 대고 라켓이나 휘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 후 일주일쯤 됐을 때 김 씨에게 마침내 게임을 경험할 기회가 왔다. 여성 회원들의 복식 경기에 파트너 한 명이 모자란 것. 깃털로 이뤄진 셔틀콕이 느린 것 같지만 실제 속도는 매우 빠르다. ‘셔틀콕의 길’을 모르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코트 한 면은 폭 6.1m, 길이 6.54m의 좁은 공간. 그 공간에서 15분 뛰었는데도 온몸엔 땀이 흥건하다.
군대가 ‘계급 사회’라면 동호인 클럽은 철저히 ‘실력 사회’다. 실력에 따라 초보로 시작해 D→C→B→A급으로 진행한다. 회원들은 암묵적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때로 눈물겹다. 클럽 내 서열 1위인 최영규(50·경찰) 씨의 구력은 10년. 최 씨는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짬을 내 산을 오르고 팔굽혀 펴기와 복근 운동도 수시로 한다.
게임의 재미야말로 클럽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최고의 힘이다. 게임은 몰입하게 하고 승부욕도 자극하기 때문. 한명선(42·교사) 회원은 “이기면 신나서 (열심히) 하고 지면 분해서 (열심히) 한다”고 이를 요약했다.
두 달쯤 지나고 승부에는 무관심했던 김 씨에게도 승부욕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뒤풀이 술자리에서 우연히 구력 7년 반인 40대 초반의 여성 회원 조미숙 씨에게 단식 도전장을 던진 것. 며칠 후 이뤄진 ‘무모한 도전’은 김 씨의 완패로 끝났다. 김 씨가 꿈에서도 셔틀콕을 보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이 게임 이후였던 것 같다.
김성규 기자 kimsk@donga.com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각계 표정-주한미군 >
-

이준식의 한시 한 수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2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3
태안 펜션 욕조서 남녀 2명 숨진채 발견…“밀폐 공간에 불판”
-
4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5
[속보]李,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부동산 정상화 의지”
-
6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7
[단독]“신천지 이만희 ‘尹은 고마운 사람, 대통령 밀어줘야’ 발언”
-
8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 車엔 프로포폴 빈병-주사기
-
9
경찰 출석 전한길 “이준석과 토론, 수갑 차고라도 나갈 것”
-
10
현직 검사, 전 연인 신체 몰래 촬영 의혹…경찰 수사 착수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5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6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7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8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트렌드뉴스
-
1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2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3
태안 펜션 욕조서 남녀 2명 숨진채 발견…“밀폐 공간에 불판”
-
4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5
[속보]李,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부동산 정상화 의지”
-
6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7
[단독]“신천지 이만희 ‘尹은 고마운 사람, 대통령 밀어줘야’ 발언”
-
8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 車엔 프로포폴 빈병-주사기
-
9
경찰 출석 전한길 “이준석과 토론, 수갑 차고라도 나갈 것”
-
10
현직 검사, 전 연인 신체 몰래 촬영 의혹…경찰 수사 착수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5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6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7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8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