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뷰스]강소국 오스트리아의 비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오스트리아는 작은 나라다.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영토에 인구는 800만 명 정도 된다. 하지만 강한 나라다. 신성로마제국 시대 합스부르크 가문부터 모차르트, 클림트,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정치, 문화, 학문 유산을 쌓아 왔다. 경제적으로는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4000달러로 독일(4만2000달러)보다도 높다. 특히 ‘히든 챔피언’(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주창한 개념으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우량 강소기업을 말함)이 116개로 우리나라(23개)의 5배나 된다.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히든 챔피언 보유 국가다.
지난달 오스트리아에 다녀왔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개발도상국의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고 AVL, 가이스링거 등 현지 기업을 방문했다. 두 회사 모두 히든 챔피언이다. AVL은 자동차 파워트레인(동력 전달장치)을 만들고, 가이스링거는 선박용 댐퍼(진동 차단장치)에 특화된 업체다. 이들 기업을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강소국 오스트리아의 비결을 요약해 본다.
첫째, 오스트리아 경제는 작은 기업이 이끌고 있다.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음료 회사인 레드불스, 유리 회사인 스와로브스키 등의 유명 회사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오스트리아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AVL은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에 이른다. 오스트리아는 허리가 탄탄해야 경제 전체가 건실하며 강소기업이 강소국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기업마다 특화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화 분야가 좁은 틈새시장이라 하더라도 세계로 눈을 돌리면 큰 시장이 된다. 두 기업 모두 제품의 거의 전부를 수출하고 있다. 기업별로 특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규모가 큰 AVL은 주력 분야인 파워트레인 이외에도 2차전지 등으로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가이스링거는 댐퍼 한 가지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넷째, 경영진은 직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의무로 여긴다. 직원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한다. 낮은 이직률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유리하다. 또한 도제식 훈련을 통해서 기술 수준이 높은 신규 인력이 지속 유입된다.
다섯째, 창업자의 후손이 대를 이어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 회사를 처음 세울 때의 기업가 정신, 혁신적 발상, 그리고 회사를 지속적으로 키워 온 윤리적 기업 철학이 대물림된다.
박희재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 전략기획 단장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슈&뷰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비즈워치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트렌드뉴스
-
1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2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3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4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5
대서양 동맹의 분열…이란 공격 찬반, 서방 주요국 확 갈렸다
-
6
트럼프의 ‘대리 지상전’… 쿠르드軍, 이란 진격
-
7
“빨리 비켜!” 구급차 막은 택시 운전석 텅~ 로보택시 ‘진땀’
-
8
[사설]“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
9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10
휠체어 탄 팬 보자마자 차에서 내렸다…김민재 따뜻한 팬서비스 화제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3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4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5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8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9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10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트렌드뉴스
-
1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2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3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4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5
대서양 동맹의 분열…이란 공격 찬반, 서방 주요국 확 갈렸다
-
6
트럼프의 ‘대리 지상전’… 쿠르드軍, 이란 진격
-
7
“빨리 비켜!” 구급차 막은 택시 운전석 텅~ 로보택시 ‘진땀’
-
8
[사설]“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
9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10
휠체어 탄 팬 보자마자 차에서 내렸다…김민재 따뜻한 팬서비스 화제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3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4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5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8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9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10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슈&뷰스]벤처-창업기업 조달문턱 낮춘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4/17/77634475.1.jpg)

![[동아광장/이정은]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308751.1.thumb.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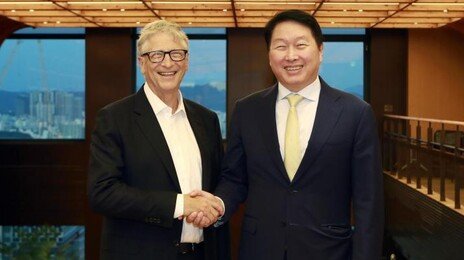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