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박제균/‘추락하는 프랑스’
-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4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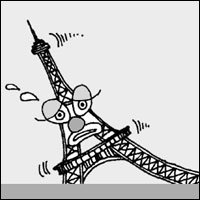
▷최근 몇 해 프랑스에 내우와 외환이 겹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극우파 장 마리 르펜이 2위를 차지해 ‘자유, 평등, 박애’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더니, 지난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반대를 주도한 이후 국제무대에서는 ‘왕따’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기나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달 초 유럽연합(EU) 확대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이 대거 EU에 들어오면서 유럽에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영어 배우기 열풍’이, 지식인 사회에서는 ‘프랑스 몰락론(沒落論)’이 번지고 있다. 파리의 거리와 지하철 광고판에는 영어강좌 안내가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파리 구청별로 실시하는 영어강좌는 프랑스 직장인과 학생들로 연일 만원이다. ‘추락하는 프랑스(La France qui tombe)’ 등 프랑스 몰락을 경고하는 책들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르몽드는 지난해 ‘프랑스 몰락’ 논쟁을 연재하기도 했다.
▷‘추락하는 프랑스’가 진단하는 몰락의 원인은 이렇다. ‘프랑스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국가기능이 강조된 ‘사회국가주의’체제다. 이런 시스템이 국가적 비능률과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프랑스 몰락론은 현실이 되기보다는 한때 지식인사회를 풍미했던 이론의 하나로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보다 국가기능을 앞세우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경고만은 새겨둘 만할 것 같다.
박제균 파리특파원 phark@donga.com
횡설수설 >
-

동아광장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4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5
“밀약 여부 밝혀야”…與의원에 보낸 국무위원 ‘합당 메시지’ 포착
-
6
K방산 또 해냈다…한화, 노르웨이에 ‘천무’ 1조원 규모 수출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9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트렌드뉴스
-
1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4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5
“밀약 여부 밝혀야”…與의원에 보낸 국무위원 ‘합당 메시지’ 포착
-
6
K방산 또 해냈다…한화, 노르웨이에 ‘천무’ 1조원 규모 수출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9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장택동]좋은 판사, 나쁜 판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9/133261829.3.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