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엔 설 음식, 다른 손으로 ‘이 책’… 배부른 ‘4D 독서’ 어때요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국인의 매운맛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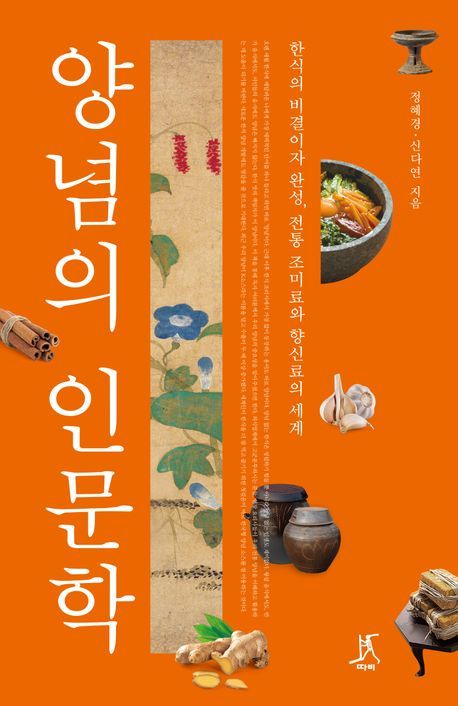
‘매운맛’ 없이 오늘날 한국인의 입맛을 논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고추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이전엔 어떻게 매운맛에 대한 열망을 충족할 수 있었을까.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우리 양념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짚은 책 ‘양념의 인문학’(정혜경, 신다연 지음·따비)은 1611년 조선의 문신 허균(1569~1618년)이 쓴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조선시대 원조 미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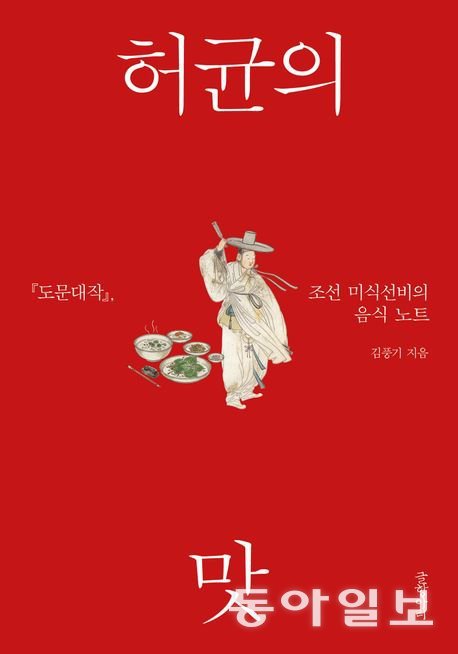
이달 발간된 책 ‘허균의 맛’(김풍기 지음·글항아리)은 ‘도문대작’을 “조선 최초의 맛집 지도”라고 평하면서 그 속에 담긴 65개의 음식을 인문학적으로 살핀다. 고소한 봄을 불러오는 생선 ‘웅어’부터 코가 뻥 뚫리는 산갓김치, 고등어 내장으로 만든 젓갈, “혼탁한 세속의 마음을 정화하는 재료”라고 표현한 마늘까지 다채로운 식재료가 등장한다.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이자 국내 저명한 허균 연구자가 풍부한 설명을 곁들여 친절하게 풀어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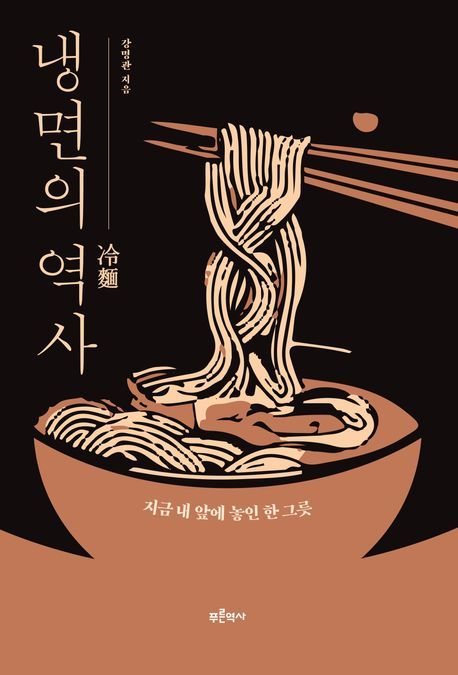
책의 ‘별미’는 19~20세기 냉면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한 과정을 다룬 부분이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평양에서는 105명의 면옥 노동자가 조합을 결성해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일으켰다. 냉면이 외식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반죽꾼과 발대꾼, 앞자리, 고명꾼, 배달부 등 냉면 노동자의 유형도 숫자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K기술력’으로 나토 장벽 뚫어야 승산…韓 vs 獨 잠수함 수주전
-
2
월 800만 원 버는 80대 부부 “집값만 비싼 친구들이 부러워해요”[은퇴 레시피]
-
3
국힘 이정현 “3당 합당-DJP 연합처럼 다른 세력 손 잡아야”
-
4
아몬드·호두·땅콩·피스타치오…건강에 가장 좋은 견과류는?
-
5
‘구독자 51만명’ 20대 마술사, 할아버지와 싸우고 불 지르려다 붙잡혀
-
6
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보수텃밭 TK서 32% 동률
-
7
트럼프 “한달내 이란과 핵협상 결론”… 핵항모 ‘포드’ 중동 급파
-
8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지급체계 전면 개편 검토
-
9
李대통령, 설 연휴 관저에서 정국 구상…역대 대통령 첫 설날은?
-
10
한동훈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 더해 송구…좋은 정치 해낼 것”
-
1
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보수텃밭 TK서 32% 동률
-
2
한동훈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 더해 송구…좋은 정치 해낼 것”
-
3
李대통령 “저는 1주택…왜 집 안파냐는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
-
4
李, 다주택 겨냥 “아직도 판단 안서나”… 설 밥상에 부동산 올려
-
5
국힘 이정현 “3당 합당-DJP 연합처럼 다른 세력 손 잡아야”
-
6
오세훈 “빨리 ‘절윤’해야…‘윤 어게인’으론 이번 선거 어렵다”
-
7
한동훈 “한줌 尹어게인 당권파, 공산당식 숙청…4심제 덮였다”
-
8
국방부, ‘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 4성 장군 2명째
-
9
李대통령, 설 연휴 관저에서 정국 구상…역대 대통령 첫 설날은?
-
10
홍준표 “내란 잔당으론 총선도 가망 없어…용병 세력 척결해야”
트렌드뉴스
-
1
‘K기술력’으로 나토 장벽 뚫어야 승산…韓 vs 獨 잠수함 수주전
-
2
월 800만 원 버는 80대 부부 “집값만 비싼 친구들이 부러워해요”[은퇴 레시피]
-
3
국힘 이정현 “3당 합당-DJP 연합처럼 다른 세력 손 잡아야”
-
4
아몬드·호두·땅콩·피스타치오…건강에 가장 좋은 견과류는?
-
5
‘구독자 51만명’ 20대 마술사, 할아버지와 싸우고 불 지르려다 붙잡혀
-
6
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보수텃밭 TK서 32% 동률
-
7
트럼프 “한달내 이란과 핵협상 결론”… 핵항모 ‘포드’ 중동 급파
-
8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지급체계 전면 개편 검토
-
9
李대통령, 설 연휴 관저에서 정국 구상…역대 대통령 첫 설날은?
-
10
한동훈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 더해 송구…좋은 정치 해낼 것”
-
1
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보수텃밭 TK서 32% 동률
-
2
한동훈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 더해 송구…좋은 정치 해낼 것”
-
3
李대통령 “저는 1주택…왜 집 안파냐는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
-
4
李, 다주택 겨냥 “아직도 판단 안서나”… 설 밥상에 부동산 올려
-
5
국힘 이정현 “3당 합당-DJP 연합처럼 다른 세력 손 잡아야”
-
6
오세훈 “빨리 ‘절윤’해야…‘윤 어게인’으론 이번 선거 어렵다”
-
7
한동훈 “한줌 尹어게인 당권파, 공산당식 숙청…4심제 덮였다”
-
8
국방부, ‘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 4성 장군 2명째
-
9
李대통령, 설 연휴 관저에서 정국 구상…역대 대통령 첫 설날은?
-
10
홍준표 “내란 잔당으론 총선도 가망 없어…용병 세력 척결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