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필하모닉 연주자들은 왜 바짝 붙어 앉을까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콘서트홀×오케스트라/도요타 야스히사 외 2인 지음·이정미 옮김/320쪽·2만 원·에포크

2003년 개관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이상적인 공연장’으로 손꼽힌다. 외관은 랜드마크로서 눈길을 끌고, 내부 음향은 또렷하고도 따뜻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개관 직후 첫 리허설에선 달랐다. LA 필하모닉 단원들은 음향 설계사를 향해 “내 쪽에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합을 맞추라는 거냐”고 일제히 항의했다.
그런데 2주 뒤 2번째 리허설에서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 단원들은 돌연 “소리가 훨씬 좋아졌는데 어떻게 한 거냐”는 상반된 반응을 쏟아냈다. 음향 설계를 책임진 도요타 야스히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바뀐 건 연주자들의 앙상블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낯선 콘서트홀에 적응하지 못한 연주자들이 다른 사람의 연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각기 큰 소리를 낸 게 화근이었다는 얘기다.
‘좋은 콘서트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건축과 음향, 오케스트라 간 관계에서 찾은 책이다. 40년에 걸쳐 세계 콘서트홀 100여 곳의 소리를 설계해 온 음향 설계사인 저자가 일본의 두 음악 저널리스트와 나눈 대화를 풀어냈다. 도요타는 일본을 대표하는 콘서트홀인 산토리홀(1986년)과 프랑스 필하모니 드 파리(2015년), 독일 엘프 필하모니(2017년) 등의 음향을 책임진 이 분야 대가다.
각 장 사이사이에 음향에 관한 상식을 다룬 ‘한 뼘 탐구’를 실어 이해도를 높였다. 좌우 폭이 좁고 천장이 높은 구두 상자 형태로 지어진 ‘슈박스형’ 콘서트홀과 포도밭처럼 객석이 무대를 둘러싼 형태인 ‘빈야드형’이 그 역사와 소리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설명해준다.
책의 향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비즈워치
구독
-

지금, 이 사람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2
“130도 안심 못 해”…30년 경력 심장 전문의 “혈압 목표 120/80”[노화설계]
-
3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4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5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6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7
8년째 ‘현빈-손예진 효과’ 스위스 마을…“韓드라마 덕분에 유명세”
-
8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
9
“코인에 2억4000 날리고 빚만 2200만원 남아” 영끌 청년들 멘붕
-
10
맷 데이먼 “넷플릭스 최고 성과급 달성, ‘케데헌’이 유일”
-
1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2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3
‘YS아들’ 김현철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수구집단 변질”
-
4
장동혁 ‘협박 정치’… “직 걸어라” 비판 막고, 당협위원장엔 교체 경고
-
5
‘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
6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
7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
8
주민센터서 공무원 뺨 때리고 박치기 한 40대 민원인
-
9
한동훈 제명, 국힘에 긍정적 18%…與-조국당 합당, 반대 44%-찬성 29%
-
10
조현 “美, 韓통상합의 이행 지연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트렌드뉴스
-
1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韓핵잠 원료 공급’ 반대 서한
-
2
“130도 안심 못 해”…30년 경력 심장 전문의 “혈압 목표 120/80”[노화설계]
-
3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4
비트코인 2000원씩 주려다 2000개 보냈다…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
5
아르헨티나 해저 3000m에 ‘한국어 스티커’ 붙은 비디오 발견
-
6
국힘 떠나는 중도층… 6·3지선 여야 지지율 격차 넉달새 3 → 12%P
-
7
8년째 ‘현빈-손예진 효과’ 스위스 마을…“韓드라마 덕분에 유명세”
-
8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
9
“코인에 2억4000 날리고 빚만 2200만원 남아” 영끌 청년들 멘붕
-
10
맷 데이먼 “넷플릭스 최고 성과급 달성, ‘케데헌’이 유일”
-
1
[단독]국힘,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
2
李 “서울 1평에 3억, 말이 되나…경남은 한채에 3억?”
-
3
‘YS아들’ 김현철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수구집단 변질”
-
4
장동혁 ‘협박 정치’… “직 걸어라” 비판 막고, 당협위원장엔 교체 경고
-
5
‘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
6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
7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
8
주민센터서 공무원 뺨 때리고 박치기 한 40대 민원인
-
9
한동훈 제명, 국힘에 긍정적 18%…與-조국당 합당, 반대 44%-찬성 29%
-
10
조현 “美, 韓통상합의 이행 지연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밑줄 긋기]시네마 쿠킹 다이어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06/133313538.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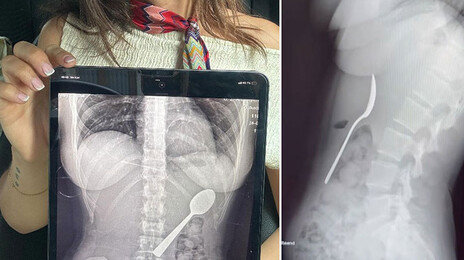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