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하느님께서 말하실 겁니다. 어서오너라, 내 사랑하는 바보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2월 21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金추기경 30년 보좌’ 강우일 주교회의 의장 고별사
배설 고통 지켜보며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기도
“(추기경님은) 이제 혜화동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국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신 다음에는 도저히 (세상에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음을 알고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탄식하며 자신에게 ‘바보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바보야. 그만하면 다 이뤘다’고.”
강 주교의 고별사 한마디 한마디에는 추기경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십 년에 걸친 세월의 정(情)이 묻어났다.
그는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이던 1977년 보좌신부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교구 교육국장과 홍보국장, 보좌주교를 지내며 추기경의 속내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혔다. 추기경이 양아들처럼 그를 아꼈다는 후문이다.
그가 추기경이 2년여 동안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해야 했던 기억을 떠올리자 미사장에는 “정말 그렇게까지야…”라는 놀라움과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주교의 입에서는 나오기 힘든 표현까지 쓰며, 김 추기경에게 더는 힘이 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우리 추기경님, 무슨 보속(補贖·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할 것이 그리도 많아서 이렇게 길게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까? 추기경 정도 되는 분을 이 정도로 ‘족치신다면’ 나중에 저희 같은 범인은 얼마나 호되게 다루시려는 것입니까?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일 전에는 “‘주님, 이제 그만하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추기경님 좀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10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10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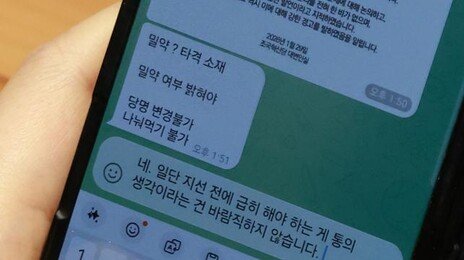
![[사설]보호가 아니라 굴레가 된 ‘기간제 2년 제한’… 이젠 손봐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69821.1.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