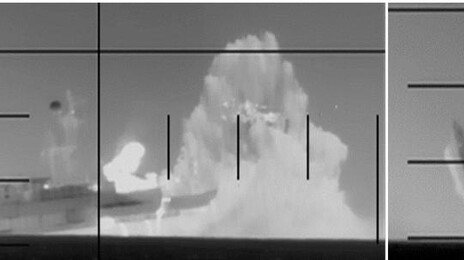공유하기
[책세상 풍경]古書속 메모 쫓아 숨겨진 역사 캐다
-
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그런데 이 해례본의 접혀 있는 낱장 뒷면에 한글이 낙서처럼 빽빽하게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대 언어학과의 김주원 교수는 이 낙서의 정체가 궁금했다. 대체 무슨 내용이고 누가 언제 적어 놓은 것인지. 그렇다고 국보인 이 책을 해체해 볼 수도 없는 일.
고민하던 김 교수는 2005년 뒷면 글씨가 비치는 사진을 구한 뒤 사진편집기(포토샵)로 사진 속 글씨를 뒤집어 하나하나 읽어 나갔다. 18세기 전후에 한글로 ‘십구사략언해(十九史略諺解)’를 옮겨 적은 것이었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맨 앞의 두 장이 떨어져 나간 시기가 18세기 이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글 사용을 탄압했던 연산군 때에 맨 앞의 두 장이 사라졌을 것’이라던 학계의 막연한 추정을 뒤집는 것이었다. 사소한 듯하지만 흥미롭고 중요한 발견이다.
이번 주에 출간된 ‘아무도 읽지 않은 책’(지식의 숲)도 이와 비슷하다. 저자는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오언 깅리치. 그는 과학과 인식의 혁명을 가져온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나갔는지, 무척이나 어렵기로 소문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대체 누가 읽고 지동설을 전파한 것인지, 그게 궁금했다.
저자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직접 뒤지기로 마음먹었다. 세계 곳곳의 도서관을 찾아 1543년 초판본과 1566년 재판본 600여 권을 모두 조사했다.
그러곤 책들에 적혀 있는 소장자의 서명과 낙서 같은 메모를 통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추적했다. 그건 지동설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우리 옛 사람들은 책뿐만 아니라 그림에 메모 같은 감상평을 적어 넣곤 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180호·1844년)를 보면 그림 왼쪽에 발문이 잇따라 붙어 있다. 이 그림을 본 20명의 감상을 적은 글이다. 그래서 그림 부분 길이가 103cm인데 발문은 무려 11m를 넘는다.
맨 마지막 발문은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였던 위당 정인보의 감상문이다. 일본인에게 넘어갔던 ‘세한도’가 다시 우리 손으로 넘어온 1940년대 말에 쓴 것이다. ‘국보 그림 동쪽으로 건너가니, 뜻있는 선비들 처참한 생각을 갖고 있었네… 그림이 돌아왔으니 이게 강산이 돌아올 조짐임을 누가 알았겠는가.’ ‘세한도’의 귀환에 대한 위당의 감격이 절절히 묻어난다.
책이든 그림이든 거기 적혀 있는 낙서와 메모를 통해 책과 그림의 내력을 엿보는 것. 그건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을 통해 한 시대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들이 쌓여 또 하나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바로 낙서와 메모의 매력이 아닐까.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2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3
李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악덕기업, 대가 곧 알게될 것”
-
4
“맨홀에 끼여 발목 뼈 산산조각” 엄지원, 日 여행중 긴급수술
-
5
세계 평균의 2.5배… 한국인의 ‘커피 사랑’, 건강엔 괜찮을까?[건강팩트체크]
-
6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7
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불법전단지 대량살포한 총책 구속
-
8
“휴일 없이 한 달 내내 일했다”…태국인 노동자 ‘400만원’ 월급명세서 화제
-
9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10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5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6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7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트렌드뉴스
-
1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2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3
李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악덕기업, 대가 곧 알게될 것”
-
4
“맨홀에 끼여 발목 뼈 산산조각” 엄지원, 日 여행중 긴급수술
-
5
세계 평균의 2.5배… 한국인의 ‘커피 사랑’, 건강엔 괜찮을까?[건강팩트체크]
-
6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7
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불법전단지 대량살포한 총책 구속
-
8
“휴일 없이 한 달 내내 일했다”…태국인 노동자 ‘400만원’ 월급명세서 화제
-
9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10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5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6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7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