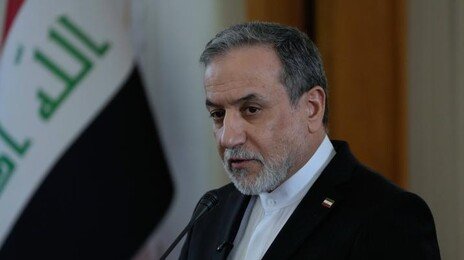공유하기
[그림으로 읽는 세상]흑백사진 속 삶의 온기
-
입력 2008년 2월 26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무엇이 저리 즐거울까.
이를 한껏 드러내고 웃는 어린이들.
웃음소리는 세월을 훌쩍 넘어 사진 밖으로 뚫고 나오는 듯하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가진 듯한이 천진한 얼굴들의 옷차림은 지금 눈에 남루해 보인다.
땔감이라도 하러 가는 길인가.
여린 어깨에 키 작은 지게를 둘러메고 있다.
‘강화도 아이들’(이형록·1956년).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최근 열린 ‘희망의 기억’전에서 만난 반세기 전의 풍경이다.》
요즘 같으면 게임기를 조몰락거리고 투정이나 부릴 나이에 어린 동생들 데리고 산으로 들로 향하는 그날의 아이들은 등 뒤로 펼쳐진 하늘처럼 티 없이 웃고 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것이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때 사람들의 심성을 보여 주기라도 하듯.
전시장에 함께 자리했던 서순삼 임응식 김광석 임석제 남상준 정범태의 흑백 사진들. 시간을 거슬러 1945∼60년 한국인의 삶을 담은 다큐적 사진에는 휴머니즘의 결이 배어 있었다. 박수근 그림에서 본 듯한 아기 업은 단발머리 소녀들, 헌책방, 닭 장수, 거리의 사진사…. 세월 속에 빛바래기를 거부하는 사진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여행의 통로처럼 보인다.
부산 최초의 사진전문미술관으로 지난해 말 개관한 고은사진미술관에서 3월 30일까지 열리는 ‘최민식 사진전’. 평생 인간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 온 원로작가 최민식(80)의 흑백 사진에도 추억 속의 사람들, 기억 속의 풍경이 오롯이 살아 숨쉰다. ‘사진 속의 아득한 시절, 아득히 먼 사람들이 내 곁으로 와서 운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서러운 인생에 귀 기울이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은 전시장에서 고스란히 실현된다.
무거운 짐을 지게 위에 지고 둑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물 위에 비친 인부들의 모습은 얼핏 평화로워 보이지만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아슬아슬했던 시절의 고달프고 치열한 삶을 엿보게 한다. 찢어진 속옷 차림으로 삽질하는 노동자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인네, 물가에서 노는 벌거숭이 아이들과 온기가 그리운 듯 옹기종기 모여 앉은 전쟁고아들…. 그가 기록한 이 땅의 일상은 ‘생존의 무서운 슬픔’이 스며 있지만 동시에 묵직한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그때가 좋네, 그립네, 우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춰 바쁘게 걸어온 길을 찬찬히 돌아보자고 말 건네는 듯하다.
50여 년 전의 이미지들이 이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짐은 왜일까. 그사이에 벌어진 산업화 서구화의 범위와 속도가 상상 불허로 크고 빨랐기 때문일까. 목숨 걸고 내달린 발전과 성장의 신작로에서 무얼 놓쳤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가난을 공유하고, 잘살아 보겠다는 마음 또한 공유했던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팔이 떨어져라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배는 어디에 와 있는가.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에도 끈끈한 정을 나누고 마음자리는 넉넉했던 시절이 세월의 저편이라면, 밥술이나 뜨는 살림살이로 저마다 거들먹거리며 심보는 되레 고약해진 게 오늘의 자화상이다. 이전에 비해 충분히 먹고 걸쳤으되 가치에 대한 방향감각은 흐릿해졌다. 자동차에 인공위성이 안내하는 항법장치까지 달고 분주히 오가지만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웃과 사물을 고장 낸 것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불행하기에 그토록 행복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행복이란 인간의 선한 모습입니다.’(최종천의 ‘당신은 얼마나 불행하기에’)
소원대로 가난은 사라졌는데 미소와 여유도 더불어 사라졌음을 사진첩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욕망만큼 푸념과 질시도 많아지고 상스러워진 지금의 모습에 그날의 사진들이 오버랩된다.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된다. 영혼이 못 따라오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 말처럼, 속도와 경쟁에 내몰려 살아가는 우리네 모양새를 크게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지켜왔던 것으로부터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일, 즉 ‘오래된 미래’에 대한 모색도 거기서 시작될지 모른다. 21세기 들어 두 번째 대통령 취임을 보며 인간과 국가의 품격을 생각해 본다.
고미석 기자 mskoh119@donga.com
바른식사 >
-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비즈워치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바른식사 좋은음식]점심식사는 직장과 먼곳에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