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자살 STOP!' 이색 의견광고 낸 벤처사업가 고현봉씨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글자크기 설정
광고주는 서울에서 작은 벤처 사업을 하고 있는 고현봉씨(40). 고씨가 ‘세 자녀 동반 자살 사건’을 접한 것은 지난달 17일 밤. 당시 그는 전북 군산시에서 3대째 가업으로 내려온 건설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옮아와 인터넷 벤처사업을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동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내와 두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큰 슬픔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물론 저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식을 내던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살 난 딸은 차마 못 던지고 안고 떨어졌다는 게 어찌나 안타깝던지….”
연이은 ‘생계형’ 자살 사건에 이어 4일 정 회장의 자살 소식을 접한 고씨는 그 자리에서 쪽지를 꺼내 광고 문안을 쓰기 시작했다. 광고비는 갖고 온 전세금을 털어 마련하기로 했다.
“광고 계약을 하러 신문사에 찾아가던 길에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1000만원을 선금으로 계약하고 입금표를 받는 순간 마음은 후련해지더군요.”
고씨는 7일 동아일보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 그리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고씨에게 수천만원이나 되는 광고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부인도 처음엔 집 구할 돈을 엉뚱한 데 썼다고 고씨를 원망했지만 나중엔 남편을 이해하고 잔금까지 마련해줬다는 것.
고씨는 광고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삶의 용기를 얻었다” 등의 격려 전화가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당신이 재벌집 아들이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전화도 있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 것.
“‘회사 광고하려고 낸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슬픈 현실을 보고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인데….”
고씨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기자의 사진 촬영 요구는 끝내 사양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트렌드뉴스
-
1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2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7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8
전원주 4200% 대박? 2만원에 산 SK하이닉스 90만원
-
9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7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10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트렌드뉴스
-
1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2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7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8
전원주 4200% 대박? 2만원에 산 SK하이닉스 90만원
-
9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5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6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7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10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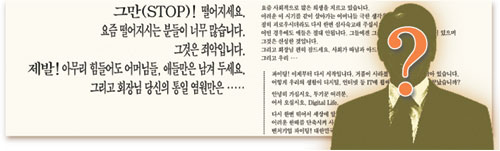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