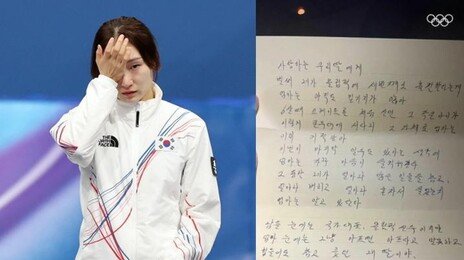공유하기
철학교수 이주향,「…가볍게 살고 싶다」펴내
-
입력 1998년 4월 17일 09시 26분
글자크기 설정
도시의 수레바퀴에서 조금만 비켜서면 세상을 바라보는 순한 눈길과 만날 수 있다고. 이발소 그림 속의 풍경, 그 ‘느림의 시간’ 속에는 도시에서 놓쳐버린 삶의 무늬가 있다고….
철학교수 이주향씨(35).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던 그가, 스스로 ‘운명을 디자인하는 여자’라던 그가, 이번엔 ‘그래도 나는 가볍게 살고 싶다’(청년사 펴냄)고 말한다. 봄을 알리는 한 마리 지빠귀처럼 도시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자유의 반란’을 부추긴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벼랑의 시대. 황량한 자본의 바다에 부표처럼 떼밀리는 도시인들. 이 책은 그들에게 떠남으로써 살아남는 오소리의 지혜를 들려준다. 그 비현실적인 ‘퇴장(退場)’의 미학.
겨울이면 긴 잠에 드는 오소리. 추운 겨울에 먹이를 구하겠다고 눈 덮인 산야를 헤맨다면 얼어죽기밖에 더 할까. 숨이 찬 지구의 시간을 정지시키고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오소리는 분명 부러운 존재다.
그러다 갑근세를 내야 할 일이 생기면 봄을 맞은 오소리처럼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저자는 반문한다. ‘충분히 겨울잠을 잔 사람만이 겨울도, 봄도 건강하다….’ 과연 그런가?
저자의 처방은 이렇다.
밑바닥 인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막상 몸으로 부딪치면 거기에는 뜻밖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의외로 입에 착착 감기는 밥맛과, 정신없이 곯아떨어지는 단잠과, 그래서 살맛나는 하루하루가….
저자의 제일 생활수칙.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조바심을 떨쳐버려라. 미국의 어느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다. ‘노인이 된 지금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많던 걱정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다….’
어디엔가 매여 있지 않으면 못견뎌하는 도시인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과장해서 걱정하는 건 아닐까. 정말이지, 회사 다니는 것 말고도 사는 방법은 많은 것 아닌가.
저자는 이제는 한번, 쉼표를 찍어 보라고 권유한다. 뭔가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 그냥 놀아보라고 한다. 니체의 말을 빌려 도대체 지칠 줄 모르고 노는 아이들을 따라가 보라고 한다.
‘어린이는 생성이며 놀이이며…,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놀 줄 아는 이는 자신의 ‘쓰임새’ 때문에 번민하지 않는다. 즐길 줄 아는 삶이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쓰임새다. ‘놀 노’자(字) 노자는 일찍이, 모든 사람이 앞서 가려고 할 때 뒤처져 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책에서는 하루에 신문 3백부만 돌리고 종일 놀기 바쁜 김창후씨와 은행이사로 있다 도배일에 푹 빠진 이상효씨를 만날 수 있다. 어느 날 홀연히 서울대 교수의 갑옷을 벗어던진 최창조씨와 풍요 속에서 자라난 가난의 이끼를 어루만지는 극작가 김운경씨를 만난다.
20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리산 산자락으로 스며든 박정수씨 부부. 그들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집지을 때 도와준 동네 장정들에게 품삯으로 추수 때 품앗이를 해 주기로 했다든지, 비탈밭에서 거둔 노란 호박과 고구마를 가마솥에 넣고 밤새 쇠죽을 쒔다든지, 아이들도 부부가 직접 가르쳐 교육도 ‘자급자족’했다든지….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결혼은 본성을 억압하는 제도일까, 아니면 본성을 다스리는 제도일까, 고개를 갸웃하는 저자. 그는 사랑이란 어쩌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다, ‘행위’가 끝나면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황소의 충동 같은 것은 아닐까? 라고 싱겁게 웃는다.
정작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저자. 그래서 항상 훌훌 떠나는 꿈에 젖는다. 그리고 조금은 지쳐보인다.
철학교수이면서도 ‘뻔질나게’ 방송에 얼굴을 내밀고 독신주의자가 아니면서도 혼자 사는 그. 살짝, 우회하듯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심경을 내비친다.
“목성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목성, 알죠? 그 목성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력을 더 받으니까 그 압력 때문에 목성 내부가 핵분열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태양이 되었겠죠. 하지만 목성은 조금 더 크질 못해 침묵의 위성이 됐어요.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어두운 영겁의 시간을 도는….”
그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그런데 그 목성이 조금 더 컸더라면 태양계는 어떻게 됐을까? 차오르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목성이 바로, 태양계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중요한 힘은 아닐까요?”
그리고 의외의 한마디를 던진다. “그런데 태양계의 질서라는 거, 그거 존중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철학자답지 않은 가벼운 ‘일격(一擊)’. 하기는,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 가벼움에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아,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사뿐히 내려앉은 그 가벼움이라니….
〈이기우기자〉
트렌드뉴스
-
1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6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트렌드뉴스
-
1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6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