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라앉을 때 스태프가 되어버린 지휘부[광화문에서/신광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9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 갑판에도 바다에도 하나도 없다. 배가 50도 기울었고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7분 목포해경 김경일 123정장이 세월호 앞에 도착해 상황실에 했던 이 보고는 당시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다. 배 기울기 50도는 이미 복원력을 잃어 언제든 침몰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그런데도 승객 등 476명이 아직 배 안에 있다는 보고였다. 그 시각 단원고 학생들은 배 갑판으로 나가는 문 앞에 줄지어 앉아 퇴선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호 생존자의 마지막 탈출 시각은 오전 10시 13분. 돌이켜보면 구조 작업에 주어진 시간은 36분이었다. 김 정장의 현장 보고 27분 전인 오전 9시 10분 해경에는 중앙구조본부가 꾸려졌다. 해경청장이 본부장을, 서해해경청장과 목포해경서장이 각각 광역·지역본부장을 맡았다. 이들 지휘부가 그 때 했어야 할 최우선 지시는 신속한 퇴선 조치였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지휘는 서장이나 지방청장이 하고 본청은 정책 지휘나 상급부서 보고가 역할이다.”(해경청장)
“중앙구조본부가 설치돼 지방청장은 지휘 라인이 아니라 스태프가 되었다.”(서해해경청장)
“123정장이 다 알아서 판단해서 잘할 것이라고 믿었다.”(목포해경서장)
사건 후 6년 만에 업무상과실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에게 법원은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123정에 영상송출 시스템 등이 없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이 그토록 무책임할 줄은 몰랐으며, 배가 화물 과적으로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유다.
대형 참사는 예상 밖이어서 대형 참사다. 겹겹의 악조건에 대비하라고 지휘부에게 높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다. 예측 불허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조직을 정비하고, 유사시 긴박한 상황에서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현장 대원들에게 적절히 임무를 주는 게 지휘관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해난구조 인력과 예산을 전체의 10%도 할애하지 않을 만큼 무관심했고 세월호가 뒤집힐 땐 ‘스태프’를 자임했다.
구조 실패에 형사책임을 진 해경은 123정장이었던 김경일 경위가 유일하다. 크기가 세월호의 68분의 1에 불과한 123정에는 당시 김 경위 등 해경 10명과 의경 3명이 타고 있었다. 소형 경비정이어서 마땅한 구조장비도 없었지만 이들 13명에게 476명 구조 임무가 맡겨졌다.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종사자에겐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게 304명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어렵게 진전시킨 사회적 합의를 후퇴시킨 면이 있다. “2014년 이전으로 회귀시킨 판결”이라는 유족들의 비판이 그래서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신광영 사회부 차장 neo@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기고
구독
-

샌디에이고 특별전 맛보기
구독
트렌드뉴스
-
1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2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5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6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7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8
“인천공항서 50만원 날렸다”…여행 필수템 ‘이것’ 반입 금지[알쓸톡]
-
9
‘다듀’ 개코, 방송인 김수미와 이혼…“서로의 삶 존중”
-
10
마차도, 노벨상 메달을 트럼프에 선물…‘환심 사기’ 총력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3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8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고장난 승마기가 30만원?”…전현무 기부 바자회 시끌
트렌드뉴스
-
1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2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5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6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7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8
“인천공항서 50만원 날렸다”…여행 필수템 ‘이것’ 반입 금지[알쓸톡]
-
9
‘다듀’ 개코, 방송인 김수미와 이혼…“서로의 삶 존중”
-
10
마차도, 노벨상 메달을 트럼프에 선물…‘환심 사기’ 총력
-
1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
2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3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4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5
① 당권교체 따른 복권 ② 무소속 출마 ③ 신당, 韓 선택은…
-
6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7
국힘 “李, 한가히 오찬쇼 할 때냐…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아와 경청해야”
-
8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
9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
10
“고장난 승마기가 30만원?”…전현무 기부 바자회 시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신규진]4월 전 北대화 재개 ‘올인’… 韓美 간 공감대는 있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5/13316866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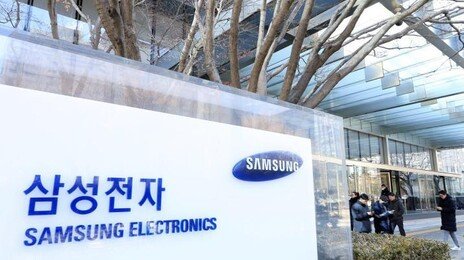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