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선거 총책에 최경환… 성적표가 차기 당권 좌우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9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총선 D-15]새누리 선대위 출범
강봉균 등 5명 공동선대위원장

새누리당은 28일 당 지도부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천 파문으로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을 함께 맡았다. 16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 승리를 위해 임시 휴전의 성격이 짙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더 이상 새누리당에 갈등과 분열은 없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서청원 최고위원도 “어제는 과거다. 모두 잊자”며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박근혜 정부가 나머지 2년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 대표와 친박계 모두 공천을 둘러싼 후유증이 이어질 경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이날 공천자 대회에선 비박(비박근혜)-친박계가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차기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대위 구성은 공천 파동으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영입한 데 이어 친박계 서청원 이인제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까지 김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2명 정도로 예상됐던 공동선대위원장을 계파별로 골고루 나눈 것이다. 나머지 최고위원들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우여 정갑윤 정병국 이주영 최경환 정우택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이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원톱 체제’로 선거를 치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공천 파문의 여진은 이날도 계속됐다. 서울 은평을 출마가 무산된 유재길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을 지역구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선거 후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당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무(無)공천이 관철된 서울 은평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오 의원은 이날 “보수 정당을 개혁하려면 여당에 (돌아)가서 여당이 국민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복당 의지를 보였다. 앞서 유승민(3선·대구 동을) 주호영(3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당선 이후 복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대표는 “(복당 논의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친박계는 유 의원 등을 향해 ‘복당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 후보를 복당시켜 주겠다고 하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뭐가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헌 당규상 복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차기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복당 논란이 또 다른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트렌드뉴스
-
1
[광화문에서/김준일]단식 마친 장동혁… 중요한 건 단식 그 다음
-
2
라면 먹고도 후회 안 하는 7가지 방법[노화설계]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브런슨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묶어두면 안돼”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단식 끝낸 장동혁 첫 숙제 ‘한동훈 제명’… 친한계 “부당 징계 철회해야” 거센 반발
-
7
더 거세진 이혜훈 불가론…“국민에 대한 도전, 지명철회 불가피”
-
8
“쿠팡, 로비로 韓-美 못 흔들 것” 金총리, 美서 공개 경고
-
9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10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1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2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3
“쿠팡, 로비로 韓-美 못 흔들 것” 金총리, 美서 공개 경고
-
4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5
단식 끝낸 장동혁 첫 숙제 ‘한동훈 제명’… 친한계 “부당 징계 철회해야” 거센 반발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8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9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10
부정청약 아니라는 이혜훈, 與도 “명백한 불법”
트렌드뉴스
-
1
[광화문에서/김준일]단식 마친 장동혁… 중요한 건 단식 그 다음
-
2
라면 먹고도 후회 안 하는 7가지 방법[노화설계]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브런슨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묶어두면 안돼”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단식 끝낸 장동혁 첫 숙제 ‘한동훈 제명’… 친한계 “부당 징계 철회해야” 거센 반발
-
7
더 거세진 이혜훈 불가론…“국민에 대한 도전, 지명철회 불가피”
-
8
“쿠팡, 로비로 韓-美 못 흔들 것” 金총리, 美서 공개 경고
-
9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10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1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2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3
“쿠팡, 로비로 韓-美 못 흔들 것” 金총리, 美서 공개 경고
-
4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5
단식 끝낸 장동혁 첫 숙제 ‘한동훈 제명’… 친한계 “부당 징계 철회해야” 거센 반발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8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9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10
부정청약 아니라는 이혜훈, 與도 “명백한 불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여기가 페이커의 성지, 롤파크 맞습니까?”[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22077.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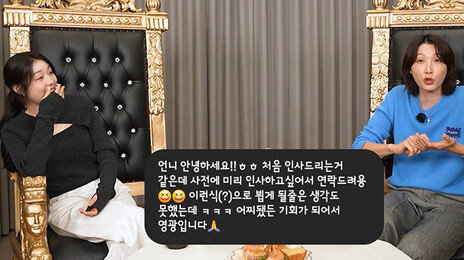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