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의 날씨/11월 12일]바람 불 때 몸 부르르 떠는 감나무
-
입력 2007년 11월 1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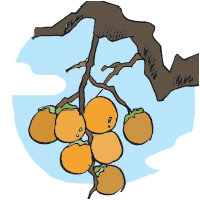
외딴마을 빈집 늙은 감나무 한 그루. 가지가 부러질 듯 붉은 감 주렁주렁. 까치마저 배부른 듯 거들떠보지 않는다. 살찐 감들은 땅바닥 마른 잎 위에 누워 무심하게 몸을 말리고, 발그레 달아오른 홍시들은 꼭대기에 매달려 아슬아슬 햇볕을 쬐고 있다. “허어, 어서 다 털고 겨울을 맞아야 할 텐데….” 바람이 불 때마다 늙은 몸 부르르 떠는 감나무. 저 멀리 기러기 울음소리.
김화성 기자
미리보는 명승부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강인욱 세상만사의 기원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Tech&
구독
트렌드뉴스
-
1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4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8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9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0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트렌드뉴스
-
1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4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8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9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0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미리보는 명승부/일본-벨기에전]양팀 "16강 분수령"](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5/29/6859329.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