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423>卷五.밀물과 썰물
-
입력 2005년 4월 4일 17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그때 한신은 항병(降兵) 3만을 거두어 장졸들에게 다독이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원래 진여는 장이에게 맡겨 처결할 작정이었으나, 진여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달라졌다. 문득 진여를 살려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급히 장이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잖아도 진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던 장이는 그런 한신의 전갈이 이르자 잘됐다 싶어 기다렸다. 오래잖아 그곳 저수((저,지,치)水)가에 이른 한신이 진여를 끌어내게 해 물었다.
“성안군(成安君)은 현사(賢士)로 이름이 높은데, 어찌하여 포악무도한 항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소? 이제라도 우리 대왕께 돌아와 대한(大漢)의 천하를 위해 일할 수는 없겠소?”
그러자 진여가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명색 선비로서 어찌 두 번 실신(失信)하여 다시 한왕에게 돌아갈 수 있겠소? 다만 내가 이끌던 장졸들은 무고하니 잘 거두어 써 주시오.”
그리고는 장이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군자는 죽일지언정 욕을 보이는 법은 아니라고 들었다. 네게 한 줌 옛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나를 더 욕보이지 말고 어서 목을 잘라라!”
그리고는 길게 목을 내밀며 눈을 감았다. 장이가 그런 진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짧은 한숨과 함께 한신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성안군의 뜻을 들어주는 게 옳을 듯싶소.”
그리고는 돌아서서 무심히 흐르는 저수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장이가 원래 그리 도량이 좁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힘써 한신을 달래 진여의 목숨을 구해줄 만한 너그러움은 끝내 되살리지 못했다. 태사공(太史公=사마천)이 그들을 두고 말했다.
‘장이와 진여는 현자라고 세상에 알려진 이들로, 그들의 빈객(賓客)과 노복(奴僕)들까지도 천하의 준걸(俊傑)이 아닌 사람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경상(卿相)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였다. 장이와 진여가 처음 빈천(貧賤)했을 때는 서로 죽음을 무릅쓰고 신의를 지키는 데 작은 망설임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움켜쥐고 권세를 다투게 되자 마침내는 서로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어찌하여 예전에는 서로 우러르고 믿는 것이 그리도 깊고 참되더니, 나중에는 그토록 모질게 서로를 저버리게 되었는가. 어쩌면 그들이 권세(權勢)와 이록(利祿)으로 사귄 때문은 아니었던가. 그들의 이름이 높고 찾아드는 빈객이 많았다고는 해도 그들이 걸은 길은 아마도 태백(太伯)이나 연릉(延陵)의 계자(季子)와는 서로 다른 것이었던 듯하다.’
태백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맏아버지가 되는데, 왕위를 양보한 일로 널리 이름을 얻은 사람이다. 문왕의 할아버지 되는 태왕이 문왕의 아버지 되는 막내 계력(季歷)에게 왕위를 전해주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둘째 중옹(仲雍)과 함께 형만(荊蠻)의 땅으로 달아나 계력에게 왕위가 돌아가게 했다. 뒷날 아우 중옹과 더불어 오(吳)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계자는 오왕(吳王) 수몽(壽夢)의 넷째 아들 계찰(季札)을 말한다. 계찰이 어질고 재주 있어 수몽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맏형 제번(諸樊)에게 양보하고 끝내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연릉 땅에 봉해져 연릉의 계자라 불리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한시를 영화로 읊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고영건의 행복 견문록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2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8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9
오세훈, 국힘 공천 받으려면 ‘1대1 결선’ 거쳐야 할듯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9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10
[단독]주한미군 무기 중동 차출 협의…핵심 ‘에이태큼스’ 거론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2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8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9
오세훈, 국힘 공천 받으려면 ‘1대1 결선’ 거쳐야 할듯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9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10
[단독]주한미군 무기 중동 차출 협의…핵심 ‘에이태큼스’ 거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五.밀물과 썰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스위스행 제지당한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오늘과 내일/신광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66288.1.thumb.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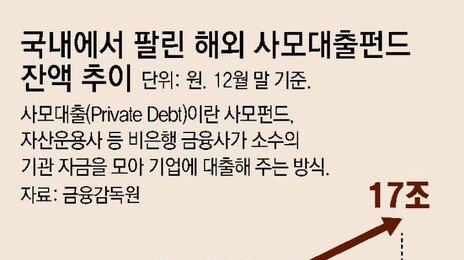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