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갈피 속의 오늘]1978년 함평 농민들 단식농성
-
입력 2004년 4월 23일 18시 46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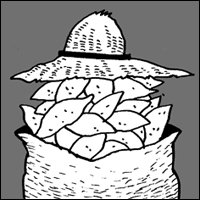
노변에 쌓아 놓은 생(生)고구마 가마니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팽팽하던 가마니가 납작해지더니 서서히 주저앉았다. 고구마가 썩어가고 있었다.
싸하고 매캐한 냄새가 천지에 진동했다.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마침내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성난 외침은 갈라지고 메말랐다. “고구마는 농민의 인권이다!”
유신체제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었으나 농민들은 ‘긴 침묵’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광복 후 농민운동의 출발이 된 ‘함평 고구마 사건’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해 4월 농협은 생고구마를 시가보다 30∼40% 비싼 가격에 수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수확기가 되자 수매는 채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의 상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아치워야 했다.
고구마 수매자금 415억원 가운데 80억원을 자기들끼리 돌려썼음이 나중에야 밝혀진다. 그 손실을 고스란히 ‘농투성이’들에게 떠넘기려 든 게다.
1977년 4월 광주 계림동 성당에서 기도회로 막이 오른 ‘고구마 보상투쟁’은 1년여를 끌다 광주 북동 성당에서 단식농성으로 막을 내린다.
‘관(官)’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피해를 보상하고 사과담화문도 발표했다. ‘고구마의 승리’였다.
1970년대의 눈부신 고도성장은 저임금(低賃金) 저곡가(低穀價) 위에 쌓아올린 것이었다. 농민들은 늘 허기를 느꼈다. 그늘은 깊었다.
도시의 봉제공장에서 두 눈을 부벼가며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고사리 손’들은 다름 아닌 그 농민의 딸이었다. 도시의 빈민층 역시 이농민(離農民)들이었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그들을 끊임없이 일하도록 닦달했으나 결코 배부르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뒤끝은 ‘세계화’인가.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여전하다. 돌아보면 아득하기만 한 1970년대. 그것은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정미소가 있는 풍경’으로 남았다.
‘생산의 고향이여/모든 부의 관리자여/그리하여 눈부신 빚더미여/붉은 양철 지붕을 뒤집어쓰고/한 마리 덩치 큰 짐승처럼 서 있는 정미소….’(안도현)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
2
17년 망명 끝에, 부모 원수 내쫓고 집권[지금, 이 사람]
-
3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4
[속보]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
5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6
[단독]위기의 K배터리…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전격 시행
-
7
“심장 몸 밖으로 나온 태아 살렸다” 생존 확률 1% 기적
-
8
[속보]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韓 무역합의 불확실성 커져
-
9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10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5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6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9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
10
“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더니 욕설
트렌드뉴스
-
1
‘李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
2
17년 망명 끝에, 부모 원수 내쫓고 집권[지금, 이 사람]
-
3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4
[속보]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
5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6
[단독]위기의 K배터리…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전격 시행
-
7
“심장 몸 밖으로 나온 태아 살렸다” 생존 확률 1% 기적
-
8
[속보]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韓 무역합의 불확실성 커져
-
9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10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5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6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9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
10
“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더니 욕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