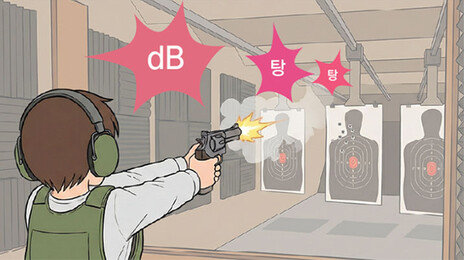공유하기
[프로야구]우즈 "헬멧 닦으면 이상하게 잘 맞아"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27분
글자크기 설정

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두산 선수들의 샴페인 파티와 환호성이 어우러졌던 라커룸. 아무도 없는 라커룸에서 우즈는 자신의 등번호 ‘33’이 선명한 유니폼들을 보며 회상에 빠지는 듯 했다. 98년 한국무대를 처음 밟고 등번호 33번을 받았을 때 동료들이 “3은 한국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로 3이 두 번 겹쳤으니 선수생활을 하면서 커다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었단다.
하긴 불과 4년만에 한국에서 그만큼 빨리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는 없었다. 98년 한국에 오자마자 홈런신기록에 페넌트레이스 MVP, 올해 올스타전 MVP와 한국시리즈 MVP까지….
| ▼관련기사▼ |
| - 부인 셰릴이 말하는 우즈는 ‘친절 꼼꼼’ |
우즈는 한국무대에서의 성공비결에 대해 ‘존재이유’가 가장 컸다고 얘기했다. “내가 왜 여기(한국)에 와 있는가를 깨닫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그 이유에 대해 내자신이 답을 하고 나니 야구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워졌다”고 밝혔다.
우즈와 얘기를 나누는 데 마침 김인식감독이 라커룸으로 들어왔다. 우즈는 한국말로 “감독님∼”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방망이와 스파이크 등 용구들을 정리하는 우즈를 보고 김감독은 “스파이크들을 모두 달라”고 했다. 김감독은 “우즈가 신던 스파이크를 얻을 수 없느냐는 청탁이 많이 들어온다. 고교선수들이 신고 싶어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국시리즈 MVP가 쓰던 스파이크를 신는다면 야구선수로선 더할 수 없는 영광일 게 분명했다. 스파이크를 주섬주섬 챙겨주는 우즈를 보고 김감독은 “이 녀석, 한국에 와서 용 됐지”하며 허허 웃었다.
사실 김감독과 우즈는 그리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언어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김감독이 선수들에게 많은 주문을 늘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김감독을 우즈는 높이 평가한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다.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때도 끝까지 믿어준다. 미국적인 스타일에 가깝다.”
라커룸에서 자리를 옮겨 구단 사무실로 갔다. 이날 우즈는 부인 셰릴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다. 그런데 셰릴이 “사진만은 찍기 곤란하다”고 손을 가로저었다. 지독한 감기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잤고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목소리가 푹 잠겨 있었다.
‘애처가’로 알려진 우즈는 수시로 옆에 앉은 셰릴의 안색을 살피면서 안절부절 했지만 약 40여분 동안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만약 현재의 기량으로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을 몇 개나 칠 것 같은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경기에 나가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즌전엔 항상 30개 정도의 홈런을 목표로 정해 놓는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선 어떨지….”
-두산 진필중과 삼성 이승엽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어한다. 이들이 미국무대에서 통할 실력인가.
“어느 팀에서 뛰느냐가 첫 번째 문제다. 과연 투수와 1루수를 필요로 하는 팀이 어떤 팀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4년간 한국야구를 접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은….
“심판이다.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파워를 갖는 게 이상했다.”
-징크스는 있나.
“첫해에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라커룸의 옷장을 다른 선수와 바꿨더니 안타가 나왔다. 타격이 안되면 옷장을 자주 바꾼다. 헬멧에 손때와 먼지가 아무리 묻어도 절대 닦지 않는 징크스도 있다. 헬멧을 닦으면 행운이 달아난다고 여긴다.”
-한국에서 야구를 하면서 4년전보다 어떤 점이 늘었나.
“일단 타석에서 참을성이 많아졌다. 볼을 구분하고 스트라이크를 공략할 줄 알게 된다는 얘기다. 기술적인 부분에선 미국에 있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민감한 사안인 ‘주니치 스카우트’건에 대해 물었다.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는 한국시리즈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우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 이에 대해 우즈는 “가능성은 50대50”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직후 “돈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어조였다.
이는 올해 21만달러를 받은 우즈가 두산과의 연봉협상에서 ‘주니치 스카우트’건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었다.
<김상수기자>sso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韓日 대중문화 동반시대]이규형/日프로덕션 ‘권력 막강’](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