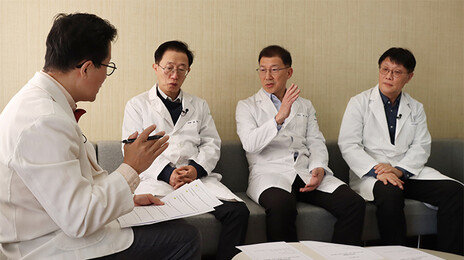공유하기
[광화문에서]김창희/누가 청진동을 죽이려하나
-
입력 2000년 2월 15일 20시 15분
글자크기 설정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 도심에 몇 남지 않은 ‘숨쉴 수 있는 공간’ 청진동이 공무원과 대기업들이 합작한 재개발 광풍에 휩쓸려 사라질 위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이곳을 살릴 방도를 당장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종로1가 북측의 청진동이 어떤 곳인지는 서울시민이면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점심시간과 퇴근 뒤 ‘도시의 유목민’들이 지나온 황무지같은 세월과 내일 다시 맞을 열사(熱砂)의 고행 틈바구니에서 간주곡처럼 목을 축이는 곳.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때로는 낙타 울음처럼 목소리를 높여도 옆자리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청진동이다.
조선시대부터 술집 밥집들이 빼곡히 들어찼던 청진동 일대 2만여평이 재개발구역으로 묶인지도 벌써 20년. 세월의 더께가 쌓이는 동안 이곳에 번듯한 빌딩을 세워 세수(稅收)를 늘리려는 공무원들과 도심 영토분할전에 나선 재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고층 고밀도의 재개발 논의는 일진일퇴를 거듭해 왔다.
그 와중에 시민들이야 편리하지는 않을지언정 편안하기로 짝을 찾기 힘든 이곳의 맛을 만끽해 왔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땅주인들의 불만이 쌓일 것은 자명한 이치. 그 틈을 비집고 최근 한 대기업이 이 지역 17개 지구 가운데 한 곳의 독자개발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 전문가와 시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재벌이 한 지구만 잘라 먼저 개발하면 틀림없이 초대형 빌딩을 세울텐데 그래서야 청진동 전체에 기존 도시의 ‘결’을 살릴 길이 없지요.”
“골목길과 음식점 하나하나가 ‘인간의 눈높이’로 살갑게 도열해 나 자신이 ‘도시의 주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게 청진동의 맛이지요. 청진동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그 맛은 영영 포기해야 할 겁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올 필요도 없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나즈막한 지붕의 한옥 골목들, 우리의 쓰리고 아린 속을 달래주던 추억의 해장국집들, 그리고 친정 고장을 옥호(屋號)로 내걸고 약간은 꼬질꼬질한 앞치마로 탁자를 훔치는 주모(酒母)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 이 기막힌 ‘원단’들이 청량리나 영등포가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떡 버티고 있다는 사실.
고층빌딩 숲속의 한복 미인이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웃고 있는 관광포스터를 서울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이제 우리의 일상과 기억 속에 스민 ‘인간적인 서울’을 포기해야 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재개발계획이 당장 준비돼야 한다. ‘옛골목의 조직과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수복(修復)형 재개발’도 이미 나와 있는 정답이다. 왜냐하면 도시는 대기업과 땅주인의 것이라기보다 자크 아탈리가 말하는 ‘도시의 유목민’들과 그들의 뿌리잃은 후손들의 손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등을 돌린 ‘대기업의 끄나풀’이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
김창희 <사회부 차장> insight@donga.com
차승재 >
-

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구독
-

송평인 칼럼
구독
-

e글e글
구독
트렌드뉴스
-
1
‘스스로 판단하는 AI 스마트폰’ 시대 열렸다… 삼성전자, 갤럭시 S26 첫 공개
-
2
[사설]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
3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빌라 옥상에 잡동사니 산더미…“못 살겠다” 울분 [e글e글]
-
6
폭설 피해 차에서 휴대폰 충전하던 대학생 사망, 왜?
-
7
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
8
[단독]코인 20억 털리고도 4년간 모른 강남경찰서…‘보관 지침’도 안지켰다
-
9
룰라에 제공된 ‘네 손가락 장갑’…“여보 이거 좀 봐요” 감탄
-
10
“전교 1등이었지만 맞기만 했다”…궤도, 학폭 피해 고백
-
1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2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3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4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5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6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7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8
브런슨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
9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0
조세호, 조폭 연루설 언급…“지금도 가끔 만나서 식사”
트렌드뉴스
-
1
‘스스로 판단하는 AI 스마트폰’ 시대 열렸다… 삼성전자, 갤럭시 S26 첫 공개
-
2
[사설]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
3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빌라 옥상에 잡동사니 산더미…“못 살겠다” 울분 [e글e글]
-
6
폭설 피해 차에서 휴대폰 충전하던 대학생 사망, 왜?
-
7
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
8
[단독]코인 20억 털리고도 4년간 모른 강남경찰서…‘보관 지침’도 안지켰다
-
9
룰라에 제공된 ‘네 손가락 장갑’…“여보 이거 좀 봐요” 감탄
-
10
“전교 1등이었지만 맞기만 했다”…궤도, 학폭 피해 고백
-
1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2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3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4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5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6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7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8
브런슨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
9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0
조세호, 조폭 연루설 언급…“지금도 가끔 만나서 식사”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