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부산/경남/동서남북]탈주범이 넘었던 검찰 문턱, 언론엔 왜 높나…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탈주범이 쉽게 넘었던 검찰 문턱이 언론에는 높았다. 검찰 청사에서 대낮 탈주 사건이 발생했지만 취재진 50여 명은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검찰은 단 한마디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울산지검에서 조사 대기 중이던 김모 씨(48·구속)가 도주한 것은 29일 오후 1시 반경. 김 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의 10여 개 납품업체로부터 3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미결수. 도주 3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검찰 대처는 허점투성이였다.
검찰은 도주 이후 30여 분 동안 직원들에게 청사 주변을 수색하도록 했다. 성과가 없자 그제야 울산남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 사이 김 씨는 검찰청사 뒤 야산을 통해 달아난 뒤였다. 형편없는 초기 대응은 물론이고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다. 경찰 200여 명이 예상도주로에서 검문검색을 했고 하늘엔 헬기까지 떴다. 울산시내가 소란해지면서 언론사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보도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달랐다. 제2의 범죄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검찰은 끝내 외면했다. 검찰의 고압적인 업무 방식은 청사에 설치된 시설물에서도 드러난다. 사무실 위치와 업무 담당자 등을 소개하는 스크린은 경비원의 까다로운 신원확인 절차가 끝나야 작동할 수 있다. 그나마 고장일 때가 잦다. 경비원 자리까지 가지 않고 현관에서 볼 수 있다면 민원인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친절한 검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6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7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8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6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9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6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7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8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6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9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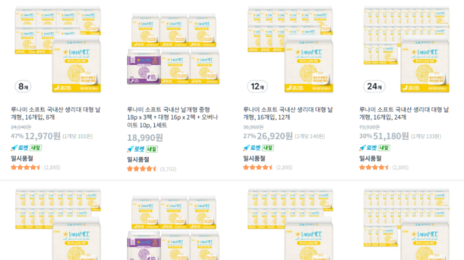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