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自活사업 실적 부풀리기 중단하라”
-
입력 2006년 3월 2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2001년에 시작해 계속 확대했지만 성공률은 2001년 9.5%에서 작년 4.9%로 줄곧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 대상자를 작년 6만 명에서 올해 7만 명으로, 예산을 2021억 원에서 2337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사업 효과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자활사업은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 실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작년 서울시에선 참여자의 87%, 예산의 72%가 공공근로 등 취로사업에 투입됐고,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일하려는 의지, 후견 기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혜자 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벌이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고도 ‘자립’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보다 못한 자활 후견 기관들이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 인원과 기간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정직하게 편성해 철저히 집행하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성공 사례도 있다. 충북의 한 재활용업체 조합원 5명은 1년간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해 작년 매출을 전년의 4.2배, 순익은 2.6배로 늘렸다고 한다. 월급도 2배를 받게 된 이들은 땀 흘린 보람을 맛보았을 것이다. ‘공짜 나랏돈’ 타먹기보다 자립 의지를 보여 준 결과다. 정부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효과는 미미한 ‘나눠 주기 복지’를 선전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지역 여건과 참여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9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0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0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9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0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0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코스피 장중 첫 5,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2/13321460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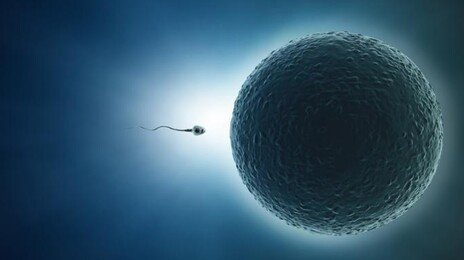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