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의료 혁신, 숫자 증원 넘어 시스템 재설계로[기고/조승연]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의 아우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간단한 질환조차 새벽차를 타고 대도시 병원으로 향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발걸음은 무겁다. 필수의료와 지역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고사 직전인데, 대도시 마천루마다 미용·성형 시술 광고는 넘쳐나고 젊은 의사들은 고소득과 안락을 찾아 개원가로 향한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2000명 의대 증원. 지난 2년 가까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본업을 놓게 한 거대한 소용돌이였다. 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사 수 부족’이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중소병원은 물론 대학병원 교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허덕인다. 지역은 더욱 참혹하다. 민간 병의원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고, 공공 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고가 장비를 놀리고 있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의사 감원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출생아는 줄어도 노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3배 이상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 요구는 비례해 상승한다.
의사 부족 해결은 이제 새 정부의 사명이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다. 증원된 인력이 실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혁신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
첫째, 늘어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기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인력 흐름을 공익적으로 유도하고,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거점 공공병원을 대폭 강화·확충해야 한다.
둘째, 영리적 비급여 시장과 엉터리 진료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실손보험과 결탁한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낭비되던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행위별 수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넷째, 모든 정책의 동력을 시민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은 특정 직역과의 합의가 아닌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직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한 절차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 패널이 구성됐다. 지역·필수의료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만이 살아날 수 있다. ‘혁신(革新)’은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수반한다. 지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이 거대한 전환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밑줄 긋기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2
이란 보복에 7성급 호텔 불길-공항 파괴…테헤란은 축제 분위기
-
3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4
李-장동혁, 말 없이 악수만…張 “대통령 기념사 박수 칠 수 없었다”
-
5
“개발만 5년” 삼성 S26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특허로 진입장벽까지
-
6
한그릇 1만5000원 봄동비빔밥 ‘품절’…제2의 두쫀쿠?[요즘소비]
-
7
“미국의 힘이 곧 평화” 트럼프 5년, 해외 美 군사개입 10번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53세 김석훈 “체력 예전과 달라”…노화만의 문제 아니었다 [노화설계]
-
10
박사과정 밟는 LG ‘신바람 야구’ 주역 서용빈 “공부하는 지금, 인생 전성기” [이헌재의 인생홈런]
-
1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6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7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8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트렌드뉴스
-
1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2
이란 보복에 7성급 호텔 불길-공항 파괴…테헤란은 축제 분위기
-
3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4
李-장동혁, 말 없이 악수만…張 “대통령 기념사 박수 칠 수 없었다”
-
5
“개발만 5년” 삼성 S26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특허로 진입장벽까지
-
6
한그릇 1만5000원 봄동비빔밥 ‘품절’…제2의 두쫀쿠?[요즘소비]
-
7
“미국의 힘이 곧 평화” 트럼프 5년, 해외 美 군사개입 10번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53세 김석훈 “체력 예전과 달라”…노화만의 문제 아니었다 [노화설계]
-
10
박사과정 밟는 LG ‘신바람 야구’ 주역 서용빈 “공부하는 지금, 인생 전성기” [이헌재의 인생홈런]
-
1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6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7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8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기고/우정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5/13316863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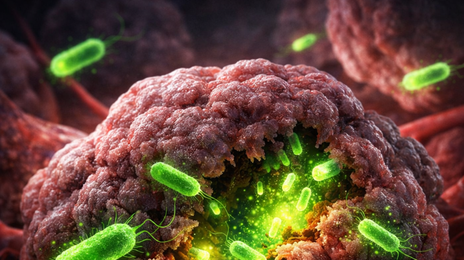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