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단단한 빛[이은화의 미술시간]〈403〉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에드바르 뭉크는 흔히 ‘절규’의 화가로 기억된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를 잇달아 잃은 경험 때문일까. 그의 그림에는 불안과 공포, 죽음과 질병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닌다. 그러나 ‘태양’(1911년·사진)은 이러한 선입견을 단번에 뒤집는다. 이 그림에는 불안 대신 생기와 에너지, 다시 시작되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다.
화면 한가운데 거대한 태양이 자리하고, 빛은 방사형으로 바다와 대지를 가로지른다. 인물도 사건도 없다. 오직 빛만이 세계를 비추고 있다. 태양은 막 떠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떠올라 세계의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존재처럼 보인다.
이 작품은 노르웨이 오슬로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공공미술로, 대학 강당 벽에 설치된 11점의 대형 벽화 중 하나다. 개인의 불안과 고독을 집요하게 파고들던 화가가 국가의 미래와 지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벽화를 맡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더욱이 뭉크는 불과 2년 전까지 심각한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수백 점의 스케치와 연습작을 남기며, 이 벽화를 자신의 예술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였다.
아침의 태양은 희망의 은유다. 그것은 현실이 아무리 버거워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절규’ 이후에 이 그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다. 깊은 절망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처럼 단단한 빛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화의 미술시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단단한 빛[이은화의 미술시간]〈403〉](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2/31/133071878.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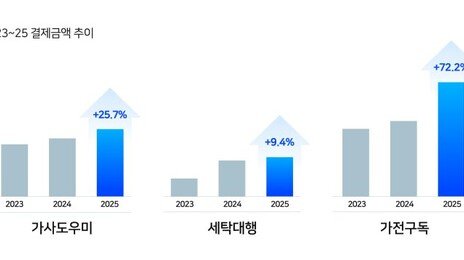

![[사설]새해 李 첫 방중… 美中 사이 활로 찾을 ‘정초 외교’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