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유종]국내 박사 4명중 1명 외국인… 고급 인재 확보 계기 삼아야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국내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졸업자는 1만7673명. 이들 중 외국인 비율은 23.9%(4224명)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를 채 넘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외국인 박사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늘어난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 정원은 외국인 학생이 채웠다. 국내 대학이 배출한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이공계 박사에서 외국인이 연간 1000명을 넘는다. 외국인 박사는 졸업까지 국제학술지(SCI급)에 평균 2편 정도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인재가 많다. 학위를 마치면 절반은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취업, 연구를 위해 미국, 유럽 등으로 향한다. 나머지 절반가량만이 국내 대학, 연구소에 남는다. 이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을 떠난다.
이들은 왜 한국에 남지 않는 것일까. 외국인은 학교를 졸업한 뒤 유학 비자(D-2)를 특정활동 비자(E-7), 거주 비자(F-2) 등으로 전환해야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유학생은 15만2094명이지만 같은 해 유학 비자를 특정활동 비자로 전환한 사례는 576명에 그친다. 전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고급 인재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최우수 인재 유치 방안 중 하나로 ‘톱 티어’ 비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글로벌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와 글로벌 500대 기업 및 세계적인 연구기관 근무 경력 등 취득 요건은 높은 편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가 과연 한국에 계속 남을지 의문이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비자 취득 요건을 더 낮춰서 매년 1000명 넘게 배출되는 이공계 외국인 박사만이라도 흡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국내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예 외국인 인재풀 등을 만들어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더해야 국내 장학금으로 키운 고급 인재를 놓치지 않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 순위는 2021년 24위에서 지난해 30위로 하락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32년 2차전지 등 5개 유망 신사업에서 석박사 출신만 1만685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 인력은 4만∼5만 명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들어왔던 고급 인력이 대부분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들이 계속 머무를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작은 도서관에 날개를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스티븐 호킹, 엡스타인 파티서 양옆에 비키니女…유족 “간병인들”
-
3
“아직 술 안 끊었다” 85세 강부자, ‘부축 논란’ 종지부 찍나
-
4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5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6
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 55억이 부동산
-
7
[동아광장/박용]월마트도 이긴 韓 기업들, 쿠팡엔 당한 까닭
-
8
60대 정신질환자 흉기 들고 태백 시내 배회…경찰이 덮쳐 잡았다
-
9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0일만에 “고객에 사과” 첫 육성 발표
-
10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30대女 “약물 투약후 운전”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4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5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6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7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8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9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트렌드뉴스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스티븐 호킹, 엡스타인 파티서 양옆에 비키니女…유족 “간병인들”
-
3
“아직 술 안 끊었다” 85세 강부자, ‘부축 논란’ 종지부 찍나
-
4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5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6
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 55억이 부동산
-
7
[동아광장/박용]월마트도 이긴 韓 기업들, 쿠팡엔 당한 까닭
-
8
60대 정신질환자 흉기 들고 태백 시내 배회…경찰이 덮쳐 잡았다
-
9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0일만에 “고객에 사과” 첫 육성 발표
-
10
반포대교서 추락한 포르쉐…30대女 “약물 투약후 운전”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4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5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6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7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8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9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임보미]모두가 즐기는 피겨 갈라… 다른 종목에도 있다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9/13326241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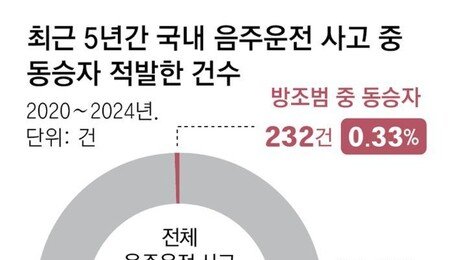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