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떻게 ‘소주성 규제 비극’ 피했을까 [특파원칼럼/이상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4일 23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끈질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가-임금 상승
최저임금 인상 택한 韓, ‘경제살리기’ 구호도 안 보여

대기업 노사 임금 협상이 한창인 일본 경제계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들려오는 단어는 만액회답(滿額回答)이다. 한국에는 없는 한자어다. 노조가 내놓은 임금 인상 요구안을 회사 측이 100%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노조 요구안을 한 푼도 안 깎으니 협상이랄 게 따로 없다. 대기업 임협을 가리켜 춘투(春鬪)라고 부르지만, ‘싸울 투(鬪)’ 자를 붙이는 게 이상할 만큼 평화롭고 화기애애하다.
사상 첫 닛케이지수 4만 엔 선 돌파로 ‘잃어버린 30년’의 무쇠 관 뚜껑을 열어젖힌 일본은 이제 30여 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임금의 두꺼운 얼음장을 깨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일본제철 14.2%, 고베제강 12.8%, 이온 6.4%, 파나소닉 5.5%…. 일본 금속노조 산하 기업의 85% 이상이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올려줬다.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다. 2012년 말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이듬해 3개의 화살(금융 완화, 재정 확대, 성장 전략)을 축으로 삼아 내놓은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라는 요청을 했다. 2010년대부터 등장한 이른바 ‘관제 춘투’다.
좀처럼 성과가 없었는데도 일본은 인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총리가 말한다고 임금이 오르냐”는 비아냥거림에도 굴하지 않았다. 도쿄 도심지 곳곳의 용적률, 고도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설 경기가 살아났다. 자국 기업은 물론 대만 TSMC 같은 기업에도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주며 일본 열도 전체에 반도체 공장 투자 열기를 불어넣었다. 엔저 장기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10년을 끈질기게 매달리니 주가가 오르고 임금 인상이 본격화됐다.
일본이 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할 때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 규제를 선택했다. 2018년 16.4%, 2019년 10.9%를 올렸다.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올리던 당시 “이대로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을 넘어버리면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무시당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 위기도 없이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 개를 밑도는 ‘고용 쇼크’를 겪었다. 반도체 공장 증설은 물, 전기 공급 인허가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막힌다. 주민 민원, 지역 숙원, 선거 공약 등을 이유로 적법한 허가마저 내주지 않는다.
10년 넘게 ‘디플레 탈출’ 정책 목표를 향해 달려간 일본은 마침내 ‘30년 만의 최대 임금 인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조만간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발표를 할 가능성도 높다. 마른 수건이 찢어지도록 쥐어짜기만 하던 일본 경제의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웃 나라는 저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조차 찾기 힘들다.
특파원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2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3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4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5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6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7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
9
[단독]은마아파트 화재 윗집 “물건 깨지는 소리 뒤 검은 연기 올라와”
-
10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5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6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2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3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4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5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6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7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
9
[단독]은마아파트 화재 윗집 “물건 깨지는 소리 뒤 검은 연기 올라와”
-
10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5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6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특파원칼럼/문병기]바이든이 국정연설서 북한만 쏙 뺀 이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3/15/12399625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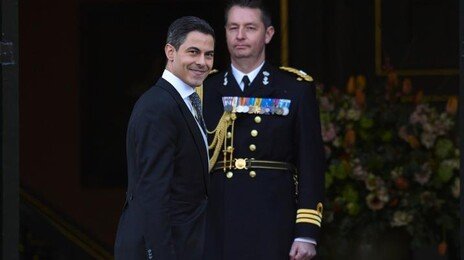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