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사람이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최근에 전기밥솥을 바꿨다. 그랬더니 이 밥솥이 참 말이 많다. 백미, 맛있는 취사를 시작하겠다, 잠금장치를 해라, 뜸을 들이겠다, 밥이 다 되었으니 밥을 저어줘라 등등 낭랑한 목소리로 야무지게 말을 건네는데 귀가 어두운 나의 친정아버지, “저게 다 무슨 소리냐?” 하신다.
그 말씀에 문득 일주일 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기에서 녹음된 안내가 나오는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한 분이 자신의 친정 엄마는 전자제품이 고장 나면 서비스센터가 아니라 딸에게 전화를 하신다고 했다.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의 안내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알았어. 엄마. 내일 서비스 기사 아저씨 보내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엄만 참 좋겠다. 대학 나온 비서 두어서.”
“야야, 근데 옆집 용기네도 세탁기가 안 돌아간단다.”
옆집의 민원까지 해결해 준다며, 덕분에 삼성, 엘지 등 각종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줄줄 외운다고 말했다. 심지어 처음에 자동응답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적에 그녀의 큰아버지는 이렇게 불평하시더라고 했다.
“내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지지배가 내 말은 안 듣고 계속 지 말만 해야.”
“사람이 사라진다.”
공포영화의 제목 같지만 실제 상황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은행에서, 유료 주차장에서, 사람 대신 기계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기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 더구나 기계는 제 말만 하고 질문은 받지 않는다. 이래저래 사람의 훈김이 그리운 세상이다.
윤세영 수필가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지금, 이 사람
구독
-

맹성현의 AI시대 생존 가이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3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4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5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6
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
7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8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4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5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6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9
“장동혁 죽으면 좋고” 김형주 막말에…국힘 “생명 조롱”
-
10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트렌드뉴스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3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4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5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6
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
7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8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4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5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6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9
“장동혁 죽으면 좋고” 김형주 막말에…국힘 “생명 조롱”
-
10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내가 당신이라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10/17/58265458.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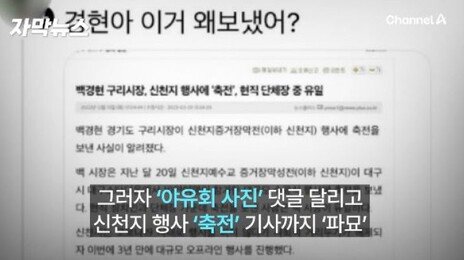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