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13>방을 보여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방을 보여주다
―이정주(1953∼)
낮잠 속으로 영감이 들어왔다. 영감은 아래턱으로 허술한 틀니를 자꾸 깨물었다. 노파가 따라 들어왔다. 나는 이불을 개켰다. 아, 괜찮아. 잠시 구경만 하고 갈 거야. 나는 손빗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골랐다. 책이 많네. 공부하는 양반이우. 나는 아무 말 않고 서 있었다. 책들을 버려야지. 불태워 버려야지. 내 얼굴에 불길이 확 치솟았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넘쳐나 있었다. 혼자 자취하는 모양이네. 우리 딸도 혼자 살아요. 그러나 걔는 짐이 이렇게 많지 않아. 짐들도 버려야지. 모두 갖다 버려야지. 나는 양손을 비비며 서 있었다. 햇볕도 잘 들고 혼자 살기 딱 알맞네. 노파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 그럼. 도시가스 들어오고 방도 따뜻하대요. 영감은 신발을 꿰며 소리쳤다. 노파는 내 얼굴을 빠안히 쳐다보며 말했다. 왜 나갈려고 그러시오? 나는 한참 눈을 껌벅거렸다. 그리고 손날로 허공을 찌르며 말했다. 먼 데로 가려고 합니다. 먼 데로? 노파의 눈이 내 손끝을 따라왔다. 노파도 같이 가고 싶은 얼굴이었다. 갑자기 현관이 멀어지고 나도 뒤로 엄청 물러나 있었다. 노파는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아득해진 공간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멀리 현관 밖에서 영감이 헛기침을 하고 있었다.
화자의 사는 모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저기 쌓이고 흩어져 있는 책들, 싱크대에 넘쳐나는 그릇들, 방바닥 한가득 펼쳐진 이부자리, 혼곤한 낮잠. 여기 불쑥 낯선 이들이 들어선다. 낯선 이들이 구석구석 살핀다. 변기도 당연히 들여다보고, 그 결에 뭉쳐 놨거나 널어놓은 속옷까지 보리라. 단칸방에 살다가 이사를 하자면 구차스러운 이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방이나 보고 얼른 나갈 것이지, 할머니는 따님이 살게 될지 모를 방의 현재 거주자한테 궁금한 게 많으시다. 왜 나가려고 그러시오? 뚱하니 입 다물고 있던 화자도 이에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황인숙 시인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5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아쉬워”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8
소방서에 1시간씩 욕설 전화… “민원 생길라” 응대하다 발 묶여
-
9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10
일하다 쓰러진 6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2명에 새 삶 선물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4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7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8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9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10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5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아쉬워”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8
소방서에 1시간씩 욕설 전화… “민원 생길라” 응대하다 발 묶여
-
9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10
일하다 쓰러진 6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2명에 새 삶 선물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4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7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8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9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10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라벨과 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10/14/5010523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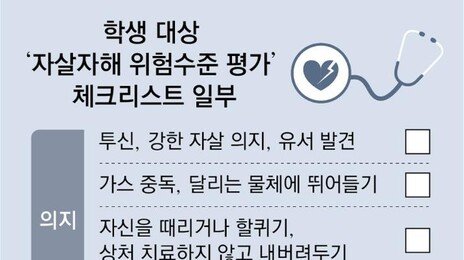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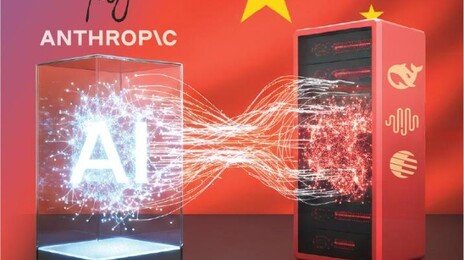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