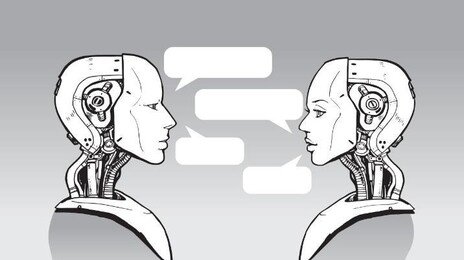공유하기
[사설]‘약품명 처방’이 제약사 리베이트 부채질한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복제약(카피약) 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 우리의 복제약 가격은 신약(오리지널약)의 최대 68%로 일본 33%, 미국 16%보다 훨씬 비싸다. 정부는 신약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복제약을 빨리 출시할수록 높은 가격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복제약을 빨리 만들어 리베이트 비용을 뿌리며 판매경쟁을 벌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비슷한 품질의 복제약 수백 개가 경쟁하니 의사들의 선택에 따라 제약회사의 수익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비싼 복제약 가격에 리베이트 비용까지 부담하는 측은 결국 환자들이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을 연간 2조∼3조 원으로 추정했다. 2009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은 29.6%(11조7000억 원)나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약제비인 17.6%의 두 배 가까이 많다. 2003∼2008년 약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3.6%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과다한 약제비는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인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
6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7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8
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
9
30년 이상 고정 주담대 나온다는데…내 대출, 뭐가 달라질까?
-
10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3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4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5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6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
6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7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8
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
9
30년 이상 고정 주담대 나온다는데…내 대출, 뭐가 달라질까?
-
10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3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4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5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6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0/1333926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