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오명철]‘임권택 감독 길어올리기’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1990년 봄, 아카데미 시상식. 일본 영상미학의 아버지이자 ‘영화의 천황’으로까지 불린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 감독이 무대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그의 나이 80세였다. 그가 동양인 최초로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자 함께 무대에 오른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커스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스필버그와 루커스는 “구로사와 아키라는 우리들의 영화적 스승이며 우리는 8mm 카메라 습작시절부터 그의 작품을 교과서처럼 보고, 또 봤다”고 회고했다. 이후 그는 세 편의 작품을 더 만든 뒤 1998년 88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일본 신문들은 그의 죽음을 호외와 1면 톱기사로 보도해 경의를 표했다.
1951년 그가 연출한 ‘라쇼몽’이 베니스 영화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영화는 세계무대에 그 존재를 알렸다. 오즈 야스지로, 미조구치 겐지가 그의 뒤를 이었다. 이후 그는 ‘7인의 사무라이’ ‘거미집의 성’ ‘나쁜 놈일수록 잘 잔다’ ‘요짐보’ 등 일본의 전통 미의식과 서구의 영화문법에 휴머니즘을 담은 작품들을 차례로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3년 동안 준비해온 20세기 폭스사의 ‘도라! 도라! 도라!’ 촬영 도중 해임당한 뒤 1971년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행히 재기에 성공해 필모그래피를 이어 나갔다. 저 유명한 서부극 ‘황야의 7인’은 구로사와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를 서구식으로 리메이크한 영화다.
일본에 구로사와 아키라가 있다면 한국에는 임권택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영화계에 그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한국 영화와 이창동 김기덕 박찬욱 봉준호 같은 감독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메이저리그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박찬호와 박세리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추신수와 신지애는 결코 나올 수 없었듯이. 그는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지금까지 그가 찍은 영화 101편은 한 편 한 편이 모두 우리 시대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임 감독의 101번째 작품 ‘달빛 길어올리기’가 지난 주말 개봉했다. 거장의 연륜과 전통 한지에 대한 천착이 묵직한 감동을 주는 영화다. 올해 77세로, 세계적 감독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지만 아직도 ‘제작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감독은 개봉 한 달여 전부터 심한 당뇨와 함께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평생의 영화적 동지인 부인 채령 씨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며 감독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강수연 박중훈 예지원 씨 등 주연배우의 노고와 헌신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 사찰에 이어 교육계도 단체관람에 나서고 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감독은 “70만 명만 들었으면…”이라고 했지만 나는 300만 명 이상 들었으면 좋겠다. 감독은 지금 전설을 넘어 신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임 감독이 흥행 실적이 좋지 않아 다음 영화를 못 만든다면, 그건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의 수치다.
오명철 문화전문기자 oscar@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송평인 칼럼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점유율 뚝-계약 줄취소…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
-
2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3
기억력 저하로 흔들리는 노후…‘깜빡깜빡’할 때부터 관리해야
-
4
[단독]“물건 보냈는데 돈 안와”… 국제정세 불안에 수출대금 8000억 떼일 위기
-
5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은?
-
6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연기…“재심 기회 부여”
-
7
‘소재 불명’ 경남 미취학 아동, 베트남서 찾았다…알고보니
-
8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9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10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5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6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7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8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9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10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트렌드뉴스
-
1
[단독]점유율 뚝-계약 줄취소…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
-
2
“살려주세요, 여기있어요” 5m 아래 배수로서 들린 목소리
-
3
기억력 저하로 흔들리는 노후…‘깜빡깜빡’할 때부터 관리해야
-
4
[단독]“물건 보냈는데 돈 안와”… 국제정세 불안에 수출대금 8000억 떼일 위기
-
5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은?
-
6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연기…“재심 기회 부여”
-
7
‘소재 불명’ 경남 미취학 아동, 베트남서 찾았다…알고보니
-
8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9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10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3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4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5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
6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7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8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9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10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하정민]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에 빌미 준 덴마크의 과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4/13315975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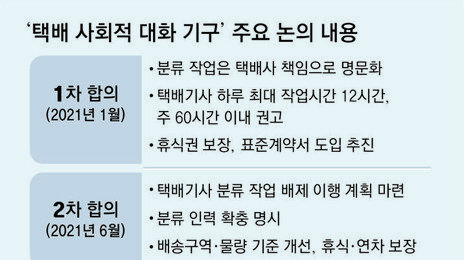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