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치솟는 집값에 2030 한숨… “집고민에 결혼-출산 미뤄”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WSJ “美 젊은층 주택문제 심각”
팬데믹 ‘집콕’에 중대형 선호 강해져
소형주택 공급 50년새 최저치 수준
130m²이하 ‘스타터 홈’ 가격 급등
“결혼식도 미뤘고 자연히 임신도 미뤘어요. 집 살 돈도 부족한데….”미국 시카고에 사는 서맨사 베라파토 씨(27)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석 달째 집을 찾고 있다.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30만 달러(약 3억4000만 원)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평수는 좁히고 교외로 범위를 넓혀도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한 베라파토 씨는 “집 사는 것 외의 모든 ‘작은’ 일들은 보류되고 있다”고 했다.
롱아일랜드에 사는 매슈 리바시 씨(35)는 최근 배우자와 살 집을 구하다가 잠시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다. 그는 “대출까지 끌어 모아 약 50만 달러(약 5억6500만 원)를 마련했지만 (나 같은) 젊은 부부가 들어가서 살 만한 집이 없다는 현실이 숨 막힌다”고 했다.
WSJ는 최근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넓고 쾌적한 중대형 주택 선호가 강해지는 가운데 ‘스타터 홈(starter home)’의 공급이 줄어 밀레니얼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젊은층이 생애 첫 집으로 마련하는 스타터 홈은 약 130m²(약 39평)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스타터 홈의 중위 가격은 23만4000달러(약 2억6000만 원)였고, 올해 4월 미국 전국 집값이 전년 대비 평균 15%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WSJ는 미 주택담보대출 회사 프레디맥을 인용해 미 주택 공급 부족이 5년째 심화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형 주택 공급은 50년 새 최저치 수준이라고 전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4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5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
7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10
[단독]은마아파트 화재 윗집 “물건 깨지는 소리 뒤 검은 연기 올라와”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트렌드뉴스
-
1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4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5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선고…구형보다 더 나와
-
7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10
[단독]은마아파트 화재 윗집 “물건 깨지는 소리 뒤 검은 연기 올라와”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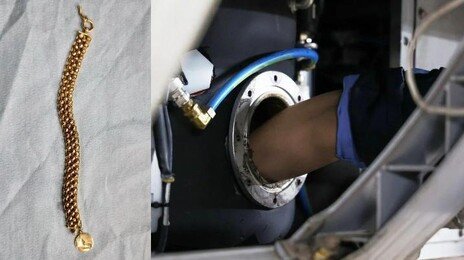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