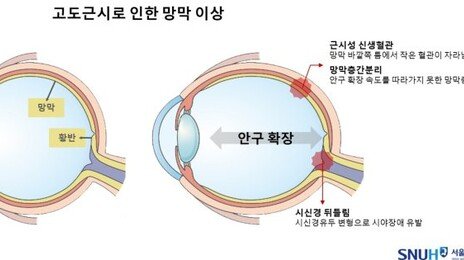공유하기
“200년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영하15도가 대수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월 22일 02시 55분
글자크기 설정
본보 하태원 특파원이 지켜본 역사의 현장
200만여 인파 새벽부터 즐거운 줄서기
취임선서 순간 흑백 감격의 포옹-눈물
20일 오전 8시(현지 시간) 워싱턴 의사당 남쪽 하원 레이번빌딩 앞에 마련된 ‘오렌지 티켓’ 출입구.
흑인 여성 권돌린 로빈슨(63·여) 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입장 티켓을 보물지도 잡듯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40년간 워싱턴 시내에서 살아온 그는 체감온도를 영하 15도까지 낮춘 칼바람 속에서도 연방 즐거운 표정이었다.
기자에게 선조가 흑인 노예 출신이라는 점을 당당히 밝힌 로빈슨 씨는 “난 63년을 기다렸다. 우리 선조들은 200년 이상 이 순간을 기다려 왔다”며 “몇 시간을, 그것도 200만 명의 미국인과 기다린 것인데 뭐가 대수냐”고 말했다.
의사당 안은 인종, 세대, 성별을 초월한 거대한 화합의 장이었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 24만 명의 입장객은 47세의 젊은 대통령을 매개로 한목소리를 내며 희망과 기대의 노래를 불렀다.
낮 12시 5분경.
하이파이브를 하며 감격의 포옹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부색은 상관이 없었다. 처음 만난 흑인과 백인이 서로 얼싸안기도 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득 품은 역동적 기운은 이날 하루 종일 워싱턴 시내를 감쌌다. 특히 오전 4시부터 200만여 명의 인파를 쉴 새 없이 실어 날랐던 워싱턴 지하철 안은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짜증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넘쳐났다.
기자가 몸을 실은 지하철도 오전 4시에도 숨쉴 공간조차 없는 초만원이었다. 하지만 역사의 현장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타게 하려고 최대한 몸을 밀착시키는 탑승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수만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내린 ‘캐피틀 사우스’역 풍경도 흥겨운 축제의 모습이었다. 안내요원이 랩을 하듯 “계속 움직이세요(keep on moving)”라고 외치자 역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동시에 구호를 외치며 질서정연하게 입구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은 희망을 찾아 움직이는 몸짓 같았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오바마, 오바마”라는 구호를 외치자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라고 화답하며 즐거워했다.
‘오바마의 날’ 열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첫날 밤을 보낸 ‘펜실베이니아 애버뉴 1600(백악관)’은 물론 워싱턴 시내 전역에서 밤새 식을 줄 몰랐다.
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