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亞 미래와 도전]<1>막오른 경제패권 경쟁…휴먼캐피털
-
입력 2005년 3월 31일 19시 29분
글자크기 설정

일반 경영대학원(MBA) 과정에서도 일주일쯤 시간을 주는 케이스 스터디를 즉석에서 해결해야 하는 고도의 지적 게임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된다는 사실부터가 취재팀엔 충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회자가 문제를 내자마자 출연자들이 곧바로 귀가 번쩍 뜨이는 전략을 쏟아낸 것이었다.
○ 끊임없는 토론으로 논리 키워
인도 특유의 속사포식 영어로 효과적인 광고전략에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 다른 업종과의 공동마케팅 전략 등이 이어졌다. 평가단에 포함된 기업인들도 연방 “참신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출연자들은 ‘인도의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 불리는 인도경영대학원(IIM) 학생들. IIM은 인도공대(IIT)와 함께 인도 엘리트 양성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
“IIM 출신에게 그 정도 문제해결 능력은 별 게 아니다.” IIM 출신으로 뭄바이에 있는 미국계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라지브 바네르지 씨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IIM 학생들은 학교에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인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집단으로 거듭난다”고 그는 덧붙였다.
○ 학생 140명에 교수 150명
아시아 각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개 경쟁을 통해 ‘소수의 천재’를 뽑아 집중 육성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평준화는 통하지 않는다.
베트남의 명문인 하노이공대 신입생 3600여 명은 입학하자마자 다시 수학 물리학 지능지수(IQ) 등 3과목 특별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를 통과한 140명은 베트남 교수 150명으로부터 영어나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특수교육을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정부가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쭐라롱콘대를 세계 100대 대학으로 키웠다. 쭐라롱콘대 프라니 티파랏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쭐라롱콘대를 졸업하면 고소득과 출세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태국은 국립인력개발청을 설립해 대학졸업자 가운데 별도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 인재로 석사 및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오전 2시에도 교수 찾아가 질문
 |
살벌한 경쟁풍토에서 학생들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다. 지난주 중국의 명문 칭화(淸華)대를 찾았을 때 수업이 없는 강의실도 학생들로 넘쳐났다. 도서관에 자리를 잡지 못한 학생들이 빈 강의실로 몰린 것이다. 지린(吉林) 성 출신의 한 학생은 “고교 때보다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IIT는 학생과 교수진이 대부분 학교에서 함께 생활한다. 이곳에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막히면 오전 2시쯤 교수를 찾아가도 전혀 결례가 안 된다. IIT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얼마 전에는 미국 CBS 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인 ‘60분’이 취재에 나서기도 했다. CBS는 “IIT는 하버드 MIT 프린스턴을 합쳐 놓은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고 보도했다.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은 매력적인 보상이다. 칭화대 졸업생들에게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이 잇따른다. 인도의 IIM도 졸업시즌인 3월만 되면 다국적기업들의 손길이 줄을 잇는다. 올해 외국회사에 취업한 IIM 졸업생의 평균 연봉은 8만 달러(약 8000만 원). 2003년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54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보상이다.
○ 日도 엘리트교육 U턴 분위기
아시아 각국이 인재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자명하다. 경쟁력 있는 인재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獨食)’의 시대적 조류도 무시할 수 없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의 리서치센터가 대거 인도로 몰려드는 것도 우수한 인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동안 엘리트 교육에 소극적이었던 ‘아시아의 선두주자’ 일본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국제기구가 세계 각국의 중학교 2년생과 초등학교 4년생을 상대로 실시한 학력평가에서 일본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당수 일본인들은 학력 저하의 주범으로 2002년부터 실시된 ‘여유 있는 교육’을 지목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수업량이 30% 감소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학습능력을 떨어뜨린 교육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못지않게 평등의식이 강한 일본에서도 엘리트 학생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亞출신 美 IT 쥐락펴락▼
“미국의 까다로운 비자발급 제도가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에 재앙이 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 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비자발급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아시아 유학생이 급감한 상황을 재앙으로 표현한 것.
그는 “미국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는 아시아 학생이 35% 줄었다”며 “미국 학생은 공학을 전공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지만 아시아계 학생은 40%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 핵심인력의 대부분을 아시아가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IIT 졸업생의 35%가 미국으로 간다. 중국 칭화대 공대 졸업생의 3분의 1도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전자기판의 집적회로를 뜻하는 IC(Integrated Circuit)는 인도인(Indian)과 중국인(Chinese)의 합성어라는 우스개도 나돈다.
그곳엔 한국인도 적지 않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경(39) 씨는 “아시아 출신이 없으면 실리콘밸리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아시아 출신의 실리콘밸리 창업도 급증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 창업 기업의 12%를 아시아 출신이 차지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선 30%까지 높아졌다.
미 IT업계에서 활동하는 거물 중에도 아시아 출신이 많다. IIT 출신인 비노드 코슬라 씨는 통신장비회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의 공동창업자다. 세계적인 통신기술연구소인 벨연구소 소장을 지낸 아룬 네트라발리 박사도 IIT 출신이다.
▼특별취재팀▼
▽경제부
권순활 차장
공종식 기자
차지완 기자
▽국제부
김창혁 차장
이호갑 기자
황유성 베이징특파원
박원재 도쿄특파원
김승련 워싱턴특파원
▽사회부=유재동 기자
▽교육생활부=길진균 기자
아시아 미래와 도전 >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아시아 미래와 도전]언어전쟁과 영어의 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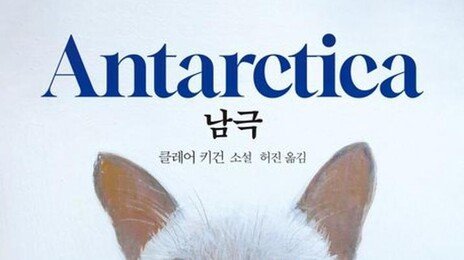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