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에서 살아보니/크리스 바이아]‘자식사랑’ 남에게도…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17분
글자크기 설정

내가 풍선을 불게 된 것은 13년 전 세상을 떠난 나의 딸 제니 때문이다. 당시 열세 살이었던 제니는 천식으로 인한 발작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하나뿐인 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후 나는 제니처럼 천식을 앓거나 다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숨쉬기를 상징하는 풍선을 불며 그들의 숨통이 확 트이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픈 아이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그 어느 나라 부모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아픈 아이를 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간혹 자식을 과잉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자신을 희생해 가며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 부모의 모습은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감탄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자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이가 아플 때도 본인의 신념대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국 부모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질병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주위에서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자주 봤다. 특히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병일 경우 더욱 그렇다.
물론 현대 의술을 과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비록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가슴 아픈 경험을 한 부모로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고 좋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안다.
외국의 경우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질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의 질병 치료를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질병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율도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아픈 자식을 둔 것은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픈 아이들이 많다. 한국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이 아픈 데만 관심을 쏟지 말고 병을 앓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는 아량을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한다. 봉사활동은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따뜻한 관심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약력▼
1947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으며 미 육군으로 30년간 복무하다 전역해 현재 주한미군 환경담당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일미군 근무시 천식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딸을 기리기 위해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 기지 내에 ‘제니의 다리’라는 작은 교량을 세우고 어린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뛰어들었다. 경기 파주시에 같은 이름의 다리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크리스 바이아 주한미군 군무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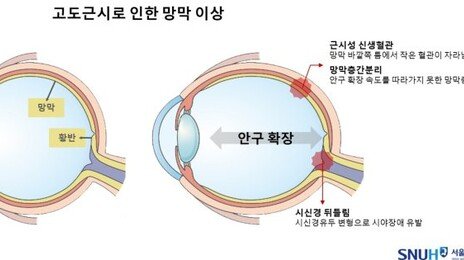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