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빚 권하는 한국사회]돈 권하는 한국사회, ‘빚’과 그리고 그림자
-
입력 2007년 6월 9일 03시 32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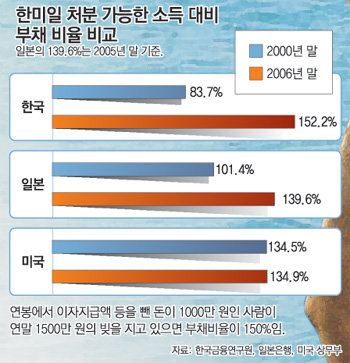

○ 빚으로 시작하는 사회 첫발
2006년 가까스로 취업한 김모(29·여) 씨. 그러나 입사 후 1년 가까이 속병을 앓았다. 대학 시절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2000만 원 때문이다. 연이율은 6.7%.
1998년 대학에 입학한 김 씨는 2학년 때 처음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3학년 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6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그만둬 빚이 더욱 늘었다.
취업 준비 3년 만인 2006년 중소기업에 취직해 받은 월급은 150만 원. 매달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 30만 원은 그의 벌이로 만만치 않다.
김 씨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빚 갚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 부동산 신화의 왜곡, 빚내지 않으면 바보?
2002년 결혼과 함께 경기 용인시에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한 이모(32) 씨.
월급이 300만 원 남짓인 그가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 정도였다. 이 씨는 은행 대출 1억7000만 원, 친지에게 빌린 1억 원,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 등으로 4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5년이 지난 지금 월급 대부분이 이자로 들어간다.
맞벌이 부부인 그는 아내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갈 작정이지만 주변의 또래 친구들은 “뭐 하러 갚느냐, 그 돈 있으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이 씨는 “빚은 일단 없애고 봐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 자영업의 그림자
대기업에 다니던 박모(41) 씨는 2003년 당시 유행하던 컴퓨터 애프터서비스(AS) 전문점을 차렸다.
창업 당시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차료와 운영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늘어났고 순식간에 빚은 40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박 씨는 2006년 말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은행과 카드사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회사마저 그만두고 지금은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 잘못된 소비가 부른 빚
도 씨는 6년 전 길거리에서 “생활용품을 보너스로 준다”는 말에 신용카드 3개를 만들었다. 신용카드가 있으니 당장 현금을 안 내도 쇼핑과 외식을 즐길 수 있었다. 써댄 돈은 신용카드 연체로 돌아왔고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함께 보험약관대출에도 손을 댔다. 빚은 올 초 6300만 원까지 늘어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다.
○ 노후 준비, 대책 없는 투자는 빚만 늘려
2003년 정년퇴직을 앞둔 회사원 최모(59) 씨는 A사 주식이 상장된다는 말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나섰다.
여윳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다니는 회사의 주거래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 여기에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과 신용카드 대출 300만 원 등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그는 “아이 결혼 비용에다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니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상장 계획은 소문일 뿐이었다. 주가는 떨어졌고 최 씨는 투자 수익 대신 빚만 떠안게 됐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4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5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6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7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8
“홀인원 세 번에 빠진 파크골프…류마티스 관절염도 극복”[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국힘 이정현 “개인 지지율 높으면 단수공천 검토…분열-갈등 안 돼”
-
10
한국야구 ‘공일증’에 또 울었다…8일 대만에 지면 진짜 끝
-
1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2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3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4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5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6
나경원 “오세훈 시장 평가 안 좋아…남 탓 궁색”
-
7
[단독]오산 떠난 美수송기 이미 대서양 건너… 미사일 재배치 시작된듯
-
8
배우 이재룡, 교통사고 뒤 도주…체포 당시 음주 상태
-
9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10
美, 이란 3000곳 타격-43척 파괴…트럼프 “10점 만점에 15점”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4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5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6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7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8
“홀인원 세 번에 빠진 파크골프…류마티스 관절염도 극복”[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국힘 이정현 “개인 지지율 높으면 단수공천 검토…분열-갈등 안 돼”
-
10
한국야구 ‘공일증’에 또 울었다…8일 대만에 지면 진짜 끝
-
1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2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3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4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5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6
나경원 “오세훈 시장 평가 안 좋아…남 탓 궁색”
-
7
[단독]오산 떠난 美수송기 이미 대서양 건너… 미사일 재배치 시작된듯
-
8
배우 이재룡, 교통사고 뒤 도주…체포 당시 음주 상태
-
9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10
美, 이란 3000곳 타격-43척 파괴…트럼프 “10점 만점에 15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