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남들이 하는 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새댁은 아랫집 할머니를 피해 다녔다. 툭하면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오니 피하는 게 상수였다. 이웃 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해해 주고 넘어가 주는 법이 없고 동네에서 다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놀랍다는 얼굴로 “새댁, 새댁이 어떻게 했기에 그 할머니가 새댁 칭찬을 하는 거야?”라고 물었다.
그 할머니가 누굴 칭찬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것이다. 놀랍기는 새댁도 마찬가지였다. 마주치면 예의바르게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했는데 할머니가 칭찬의 말을 했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더 알 수 없는 것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후 변해 가는 자기 자신이었다. 먼발치에서 할머니를 보게 되면 피하지 않고 다가가 더 상냥하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 그러다 보니 나중엔 서로 진짜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했다.
딸을 결혼시키면서 지인은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엄마에게 전하지는 말라”는 지침을 주었다. “너는 다음 날이면 남편과 풀고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사위에게 서운하고 괘씸한 감정이 오래 남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 누구나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할 수 있고 싸움을 하다 보면 도를 넘는 말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막상 딸에게서 그런 말을 전해 들으면 사위의 한마디 한마디가 뇌리에 박혀 뒤끝이 남기 때문이다.
아, 말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아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만 유효한 것임을 깨닫는다. 말이란 대부분 만약 그때 그 공간에서 상대가 마침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꺼내지도 않았을 그런 것들이기 쉽다. 좋은 말은 전하여 세상을 향기롭게 하되 나쁜 말은 그냥 그 순간과 함께 흘러가 버리게 하는 게 상책일 수 있다.
윤세영 수필가
트렌드뉴스
-
1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2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3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4
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
5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6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단독]임성근, 4차례 음주운전 적발…99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적발
-
9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0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6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트렌드뉴스
-
1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2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3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4
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
5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
6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단독]임성근, 4차례 음주운전 적발…99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적발
-
9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0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6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어머니의 선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2/04/7630429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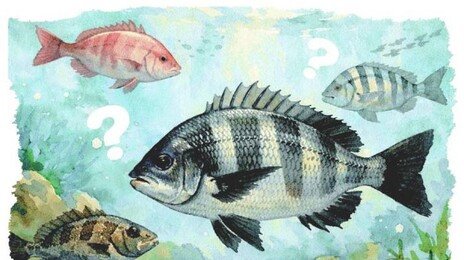
![[오늘과 내일/이세형]트럼프 남은 임기 3년이 더 긴장되는 이유](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198359.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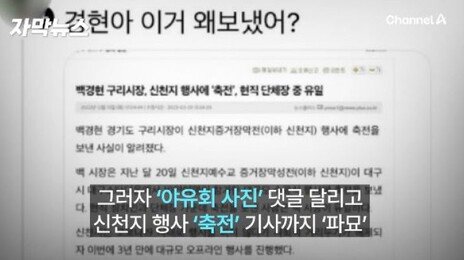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