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O2]더블 파이어 맛좀 볼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 신의 손가락 -포트리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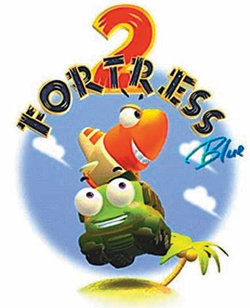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나와 친구들을 사로잡은 게임이 둘 있었다. 하나는 ‘스타크래프트’, 다른 하나는 ‘포트리스2’였다. 스타크래프트의 아성은 너무도 굳건해서 그 어떤 게임도 이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아이들은 자면서도 마우스를 움직이고 끊임없이 단축키를 눌러댔다. 그 덕분에 꿈은 언제나 전투적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처럼 피곤했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사감 몰래 담을 넘는 일이 많았다. 그것을 우리는 새벽 러시(rush·스타크래프트에서 상대 진영에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불렀다. PC방에 사이좋게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총총 눈알을 굴렸다. 첫 게임은 어김없이 스타크래프트였다. GG(Good Game·이번 게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용어다)를 외치고 나면, 허기가 지고 멍해졌다. 게임에서 밀려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멀거니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포트리스2에 더욱 매료되었다. 스타크래프트는 플레이가 끝나면 온몸의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았다. 영어 다음 시간이 수학이고 수학 다음 시간이 물리인 것처럼, 에너지가 거짓말처럼 고갈됐다. 손놀림이 그다지 날렵하지 않던 나는 적게는 5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남들보다 두 배 이상 더 집중해야만 했다.
적진의 중앙에 내 탱크가 위치해 있으면 상대 팀원들은 사정없이 내게 포탄을 날린다. 우리 팀원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 꿀꺽 침을 삼키고 지원 사격을 해준다. 바람을 보고 각도를 조절한 뒤, 더블 파이어(같은 힘과 같은 각도로 포탄이 2번 연속 발사되는 아이템)를 흡입하고 멋지게 포탄을 날린다. 에너지 탄을 쏴서 에너지를 보충해주기도 한다. 불량배들에게 붙들려 있을 때 나를 구하러 와준 의리 있는 친구 같다. 이 익명의 공간에서 친밀감이 형성되다니! 스카이에서, 밸리에서, 스핑크스에서(이는 포트리스2에서 플레이가 벌어지는 맵의 이름이다), 1-1로 2-2로, 때로는 4-4로.
탱크의 에너지가 제로가 되거나 탱크가 맵 밖으로 이탈하면 화면이 흑백으로 변한다. 진짜 게임은 이때부터다. 우리는 부지런히 타이핑하기 시작한다. 같은 편을 응원하는 글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사심을 발휘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포트리스 애인을 만들고 상대를 ‘포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 끓는 고등학생이었다.
방장에 의해 강퇴(강제 퇴장)를 당할 때의 심정은 그야말로 고약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방 밖으로 내친 것이다. 똥을 씹으면 이런 기분일까. 이렇듯 권력의 무서움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기숙사에 돌아오는 길에는 인도에 흩뿌려진 자갈들을 뻥뻥 찼다. 신나게 게임해도 해소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등 뒤에 땅방울처럼 흘렀다. 우리는 난생처음 사이좋게 고독했다.
오은 시인 wimwenders@naver.com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동아광장/박용]
-
2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3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4
[단독]‘이적설’ 김민재 前소속 연세대 “FIFA, 기여금 수령준비 요청”
-
5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6
美 “韓 국회 승인전까진 무역합의 없다”… 핵잠 협정까지 불똥 우려
-
7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10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동아광장/박용]
-
2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3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4
[단독]‘이적설’ 김민재 前소속 연세대 “FIFA, 기여금 수령준비 요청”
-
5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6
美 “韓 국회 승인전까진 무역합의 없다”… 핵잠 협정까지 불똥 우려
-
7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10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