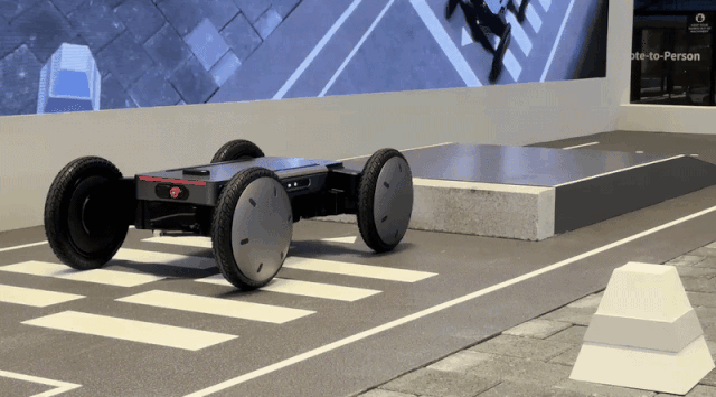공유하기
두 번째 시집 펴낸 ‘모더니즘 젊은 기수’ 정재학 시인
-
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이곳의 풍경은 너무 선명해서 진짜 같지가 않아/길 위에 보이는 저것은 산호초인가 핏줄 다발인가/낡은 도시의 폐쇄로, 완벽한 일식의 지점을 보기 위해 찾은 곳/이 길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안개비, 검붉게 타는 자동차 몇 대 노파 그리고 나’(‘Psychedelic Eclipse’ 중에서)》
그의 시에는 언제나 도시 냄새가 난다. 삭막하거나 활기차거나. 대도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세대의 스산함이 짙다. 2004년 첫 시집 ‘어머니가 촛불로 밥을 지으신다’로 박인환문학상을 받으며 한국 모더니즘 시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평가받아 온 정재학(34·사진) 시인이 두 번째 시집 ‘광대 소녀의 거꾸로 도는 지구’(민음사)를 냈다.
27일 그가 재직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 교정에서 만난 시인은 딱 ‘수줍은 총각 선생님’이었다. “아직 완성판은 못 봤는데…”라며 기자가 가져온 책을 환하게 펼쳐드는 미소, “낮이라 술 마시긴 좀 그렇죠?”라고 묻는 엉뚱함. 그러면서 답 하나마다 찬찬히 말을 고르는 그는 천생 시인이었다.
―3년 만에 새 시집이 나왔다. 첫 시집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음…. 첫 번째 시집을 내고 ‘안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비약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방향의 변화보단 깊이 파고들었다 할까. 전체 콘셉트 같은 건 없다. 15편의 ‘미분’이나 10편짜리 ‘Edges of illusion’(동명의 팝송에서 제목을 따왔다) 같은 연작시를 많이 썼다. 실험 자체가 즐거웠다. 앞으로도 연작시를 많이 쓰려 한다.”
―‘정재학의 시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 원래 음악이나 미술도 현대예술이 난해하다.(웃음) 물론 난해한 시가 좋은 시는 아니다. 하지만 쉽다고 좋은 시일까. 시는 함축적인 언어를 쓰는 만큼 하고 싶은 말을 지워가는 작업이다. 난해함은 시의 목적은 아니지만, 시인의 내면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 처음부터 어렵자고 맘먹은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하나의 스타일로 자연스레 흘러왔다.”
―이번 시집은 연작시만큼 산문시도 많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도시의 영향인 것 같다. 우리 1970년대생은 도시에서 태어나 검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회색 건물 사이에서 자라난 이가 많다. 구별할 수 있는 나무란 게 소나무 느티나무 몇 그루 안 된다. 찔레꽃도 최근에 ‘이거구나’ 했다. 자연을 소재로 삼는 전통적인 시와는 교감이 어려운 세대적 상황도 한몫했다. 그리고 도시에선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간다. 사람도 풍경도 휙휙…. 집에 오면 이미지만 남는다. 여백과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이 빽빽한 산문시로 발현됐다.”
이런 심정은 시인의 표제시 ‘광대 소녀의…’에도 등장한다. ‘회전문 밖에는/비가 내리고 있었다/거리의 모든 것들이/획획 지나갔다/무엇 하나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다’
―독자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시를 읽지 않는 시대’에게도….
“시인에게 시 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좋아서’, 달리 할 말이 없다. 더 멋진 의미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발표된 시의 주인은 시인이 아니다. 시인의 의도보다는 독자들이 주체적으로 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감상이나 해석이 천차만별인 것도 시의 매력이다.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교과서 시들은 그런 점에서 불행한 시가 아닐까.”
글·사진=정양환 기자 ray@donga.com
트렌드뉴스
-
1
이라크 쿠르드 반군, 이란 지상전 개시… “美서 지원 요청”
-
2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3
[단독]美,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차출 가능성… 패트리엇-사드도 거론
-
4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5
“청소기로 햄스터 흡입” 수사중에도 학대 생중계한 30대
-
6
與, 우상호-박찬대 공천 확정… 野, 서울 오세훈 등 2단계 경선 검토
-
7
‘성폭행 의혹’ 교수 무혐의에도…폭로한 여교수 명예훼손 무죄, 왜?
-
8
칼과 돈 모두 움켜쥔 모즈타바, 혁명수비대 업은 막후 실세
-
9
결국 접은 마포구 소각장… 자치구간 ‘쓰레기 돌리기’
-
10
현대車, ‘모베드 동맹’ 출범… AI 로봇 상용화 박차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4
[단독]美,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차출 가능성… 패트리엇-사드도 거론
-
5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8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9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트렌드뉴스
-
1
이라크 쿠르드 반군, 이란 지상전 개시… “美서 지원 요청”
-
2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3
[단독]美,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차출 가능성… 패트리엇-사드도 거론
-
4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5
“청소기로 햄스터 흡입” 수사중에도 학대 생중계한 30대
-
6
與, 우상호-박찬대 공천 확정… 野, 서울 오세훈 등 2단계 경선 검토
-
7
‘성폭행 의혹’ 교수 무혐의에도…폭로한 여교수 명예훼손 무죄, 왜?
-
8
칼과 돈 모두 움켜쥔 모즈타바, 혁명수비대 업은 막후 실세
-
9
결국 접은 마포구 소각장… 자치구간 ‘쓰레기 돌리기’
-
10
현대車, ‘모베드 동맹’ 출범… AI 로봇 상용화 박차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4
[단독]美,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차출 가능성… 패트리엇-사드도 거론
-
5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8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9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