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아침의 시]이승욱/‘두 악기’
-
입력 2005년 9월 15일 03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그래서 고모도 더 아프다
대청마루 위에 불거져 나온
물기어린 뼈와 뼈
찬연했던 한때의 연주
숙연히 끝내고, 찾았던
관중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돌아설 때 가장 슬픈 소리를 내는
두 악기를 닮아간다
귀를 씻어도 금세 넘쳐나는 밀물처럼
두 악기 소리 내 귓바퀴 속에 지칠 때
고개 들어 저 빈 들에도 가득
소리 없는 가을 음악
내 슬픔을 끌고 가는
맨드라미 신음의 몸빛이
터질 듯 붉다!
- 시집 ‘지나가는 슬픔’(세계사) 중에서》
조카님, 객지서 먹고 사니라 바쁠 텐디도 못난 우리들 보겄다구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네. 나야 뭐 고모부 병 수발 핑계루 입성도 갖춰 입지 못하고, 늘상 젖은 복사뼈 불끈 나온 맨발일세. 아파도 아픈 사람 거두느라 아플 새도 없으니 그도 내 복 아니겄나? 허허, 말이 보밸세. 아픈 우리 두 내외가 악기를 닮았다구? 하긴 다 진 저물녘이래두 몸서리치도록 연주하고픈 게 있기는 있지. 석양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 저 황금노을 좀 보게. 삶이야 제 아무리 슬퍼도 ‘지나가는 슬픔’이라고. 고통도 찬란하기야 연주하기 나름이라고.
시인 반칠환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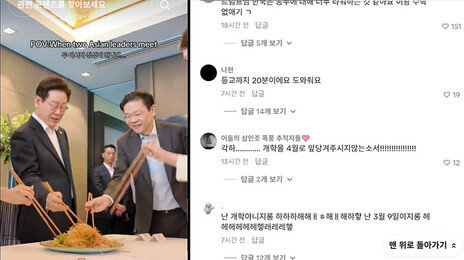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