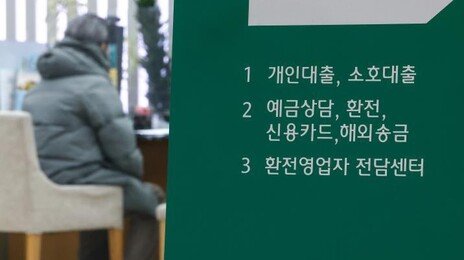공유하기
[테니스]테니스 복장의 기본은 흰색
-
입력 2002년 1월 18일 17시 31분
글자크기 설정

이들이 흰색을 선호라는 까닭은 ‘백의민족’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테니스 웨어는 원래 흰색이 기본. 중세 유럽의 왕실 성직자 귀족 사이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테니스는 전통을 중시, 순수한 흰색만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세월과 함께 변화를 거듭했고 최근 코트에는 패션화 바람이 거세다.
19세기에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에 장식이 달린 큰 모자와 스카프차림이 기본이었다. 남자선수들은 긴바지에 드레스 셔츠를 입고 라켓을 휘둘렀다.
1923년 윔블던 5연패를 달성한 ‘전설의 스타’ 수잔 랑랑(프랑스)은 처음으로 무릎이 보이는 치마에 민소매 윗도리를 입어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1932년 버니 오스틴은 반바지를 입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기능성이 강조돼 서브와 스트로크를 하는 데 편하도록 치마와 소매 길이가 짧아졌다. 하지만 모양은 조금씩 바뀌었어도 색깔만큼은 70년대에 이르도록 흰색이 지속됐다.
컬러화가 이뤄진 것은 1980년대. 존 맥켄로는 빨간색 헤드밴드를 하고 나왔고 안드레 아가시는 청반바지에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어 이런 분위기를 선도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이후 노출이 심한 파격적인 옷이 나타났다. 지금은 탱크탑이나 핫팬츠는 예사이며 등이 훤히 드러나거나 배꼽이 보이는 등 눈을 현란하게 하는 패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나 쿠르니코바, 마르티나 힝기스, 윌리엄스 자매, 마리 피에르스 등이 대표적 패션 리더. 남자선수 가운데는 레이튼 휴위트, 앤디 로딕 등이 여기에 꼽힌다.
김종석기자kjs0123@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서현의 「우리 거리」읽기3]테헤란路는 가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