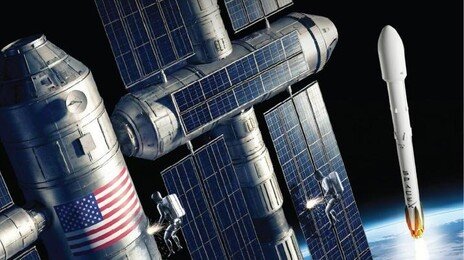공유하기
[문학예술]이문열씨 4년만에 단편 '김씨의 개인전'펴내
-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28분
글자크기 설정

이씨는 최근까지 언론 세무조사 정국에서 첨예한 공방의 한 복판에 서 있었다. ‘홍위병’ ‘곡학아세’ 등의 말을 유행시켰던 그는 최근 논쟁을 접으면서 “이제는 작품으로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작품은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주장을 담지 않았다. 저명한 조각가 밑에서 10년 넘게 ‘조수’로 일해온 김씨 노인이 조수를 그만둔 사연을 그렸다. 일종의 ‘예술가 소설’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묻고 있다.
김씨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제 일을 해야겠다”면서 따로 작업실을 내고 개인전을 열겠다고 선언한다. 석수(石手) 출신으로 조각가 황씨 작품 제작을 도맡아왔던 김씨로서는 ‘작가선생들 시늉’이야 일도 아니란 생각이다.
소설은 김씨의 그늘진 삶의 굴곡을 보여준다. 직장을 다니다가 삶에 회의가 들어 ‘출가’하듯 가출한 사연, 순정을 바쳤던 ‘흑룡강 색시’에게 예술가가 아니라고 배신당한 이야기 등 갖가지 곡절이 드러난다.
작품 마지막에 작업실 천막에서 마련된 김씨의 개인전은 ‘기이한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정작 전시된 것은 조각가 황씨의 작품을 복제한 듯한 조각품이 아니라 이를 파고 남은 돌 부스러기들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작품의 주제를 “삶과 예술의 관련성”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치기 어린 행동에 대한 온정적 시선에는 “예술은 삶과 유리된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는 작가의 예술관이 담겨 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이씨가 창작에서 사회적 발언을 완전히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소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쓰기 직전에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출산면허’ 등 이미 구상이 끝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소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씨는 이 중 한 두 편을 뽑아 10월경 ‘아우와의 만남’(1994년) 이후 여섯 번째 작품집을 묶어낼 계획이다.
그 후 이씨는 ‘큰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매달릴 생각이다. 1980년대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현대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시대를 선택한 것은 한국의 ‘문제적 상황’ 중 상당수는 이 때 해결되지 못한 사회문제의 결과라는 소신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를 소설화하는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그는 ‘소설가의 책무’를 들어 반론을 폈다.
“소설가의 존재 이유란 당대의 총체성을 이야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역사를 다룬다 하더라도 소설은 곧 당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정치적 상황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빼고 삶의 본질을 말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정훈기자>digana@donga.com
스타일 >
-

동아닷컴 신간
구독
-

사설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